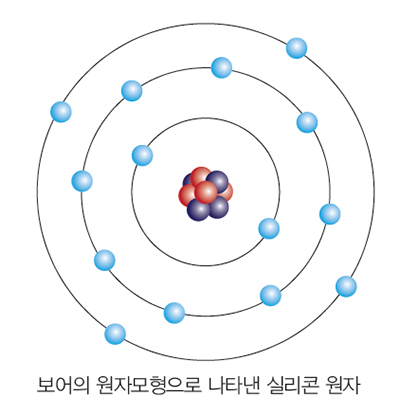방학 중과는 달리 요즘은 크고 작은 활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고 있다. 그러다 보면 커다란 이슈가 터져도 잠깐 관심을 기울일 뿐 곧잘 머릿속에서 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 ‘새콤달콤 키워드’는 그렇게 잊혀질 뻔한 학내·외의 이슈를 환기하면서 웃음까지 덤으로 얻어갈 수 있어, 개인적으로 빼놓지 않고 즐겨 읽는 코너다. 그런데 지난 98호에서는 이 코너가 김 빠진 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다소 밋밋하게 읽혔다. 지나간 여름날의 이슈들이 너무 무거웠던 탓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바라보는 기자의 시선이 지나치게 진중했던 까닭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새콤달콤 키워드’의 웃음은 항상 그 웃음 너머에서 답답함을 날려주는 통쾌함과 핵심을 콕 찌르는 신랄함을 동시에 선사해 왔다. 코너를 읽고도 웃지 못해 마냥 아쉬웠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에서 너그러이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두 세 가지 아쉬운 점을 더 언급할까 한다. 우선 공대 학생회와 행정실 사이의 논쟁을 다룬 ‘자보의 재구성’기사는 다소 미숙한 편집이 아쉬움을 남겼다. 학생회, 행정실, 그리고 저널의 입장이 일관된 서식으로 편집되지 않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기획코너에서도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서울대 법인화를 소재로 다룬 것은 시의적절 했지만, 법인화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다섯 기사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거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구성이 난해했다. 저널만의 목소리로 논쟁의 핵심을 풀어내는 세심한 배려가 아쉬워지는 대목이었다.한편 지난 98호에서는 ‘미디어법’이라는 공통의 키워드에서 파생한 세 개의 기사(‘미디어법 이후의 미디어를 묻다’, ‘지역신문, 미디어법 통과에 ‘엎친 데 덮친 격’’, ‘말레이시아 미디어와 정치’)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이 각기 다른 섹션에 분류되어 있는 탓에 기사 사이사이로 다른 기사들이 끼어든 모양새가 돼버렸다. 저널을 앞부분부터 정독하려는 독자들에게는 전체적인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별도의 코너로 기사들을 한데 묶어내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온전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과정이 가만히 앉아 ‘다 된 밥’을 두고 흠 잡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평소 의 논조가 개인적인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까닭에 이번 독자의견도 기사의 내용보다는 구성이나 편집에 대한 언급에 치우친 점 양해 부탁드린다. 이제 곧 100호를 맞이하는 이, 사회와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더 큰 그릇’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더 큰 그릇’을 기대하며
방학 중과는 달리 요즘은 크고 작은 활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고 있다.그러다 보면 커다란 이슈가 터져도 잠깐 관심을 기울일 뿐 곧잘 머릿속에서 잊게 되는 경우가 많다.의 ‘새콤달콤 키워드’는 그렇게 잊혀질 뻔한 학내·외의 이슈를 환기하면서 웃음까지 덤으로 얻어갈 수 있어, 개인적으로 빼놓지 않고 즐겨 읽는 코너다.그런데 지난 98호에서는 이 코너가 김 빠진 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다소 밋밋하게 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