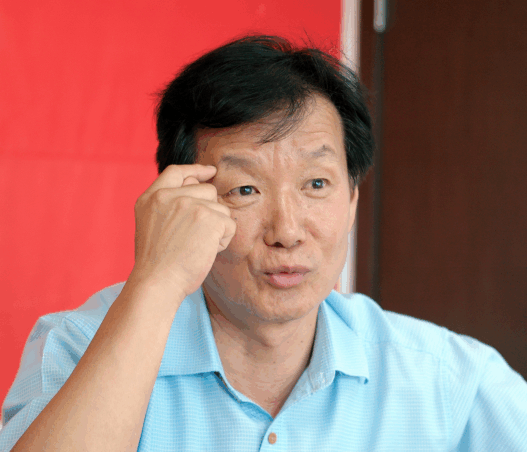‘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유럽을 점령하는 순간’, ‘6 · 25 전쟁의 옛 전우이자 혈맹.’ 보수 논객의 칼럼 구절이 아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의 4강 진출을 ‘쾌거’라며 칭송했던 공중파 방송사들의 뉴스 내용이다. 언제부턴가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들은 ‘태극전사’가 됐고, 축구 경기는 국가 간의 대항전이 됐다. 공격수의 슛이 골포스트를 벗어난 다음날 스포츠면 헤드라인은 ‘방아쇠는 당기는데 조준이 안 되는 일’이었다. 스페인을 이긴 다음 날에는 ‘무적함대를 격침시킨 대첩’이라 쓰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2007년 한국에서 ‘태극전사’는 스포츠 기자들이 애용하는 단어이다. 처음에는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호칭으로부터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 일반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최근 WCG 2007 그랜드 파이널에 출전하는 e스포츠 선수들도 ‘태극전사’라고 불린다.
| ###IMG_0### |
| 심지어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까지도 요즘엔 ‘태극전사’라 불린다. |
한국 스포츠 보도에는 군사주의가 넘치고 있다. 언론은 ‘전사’들이 지면 ‘패잔병’이라 몰아세우고, 외국인 선수를 ‘용병’이라 부른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승엽이 소속된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거인군(巨人軍)이라 불리고, 스페인 언론 역시 활발한 클럽간 축구 경기를 전쟁에 비유하는 등 군사주의적인 냄새를 풍긴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군사주의가 득세했던 일부 국가들에서나 성행할 뿐, 오늘날 구미와 아랍 그 어디에서도 그런 색채는 일부 황색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기 힘들다. 한국 언론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한국 언론의 스포츠 군사주의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유래한다. 당시 영국 보수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본 문부성은 ‘강인하고 건전한 심신의 선량한 황민’ 육성을 목표로 1931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교련과 검도 · 유도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등 일본 제국의 스포츠를 군사주의와 결합시켜 육성했다. 기자들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를 서양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영웅으로 대서특필하는 등 국가의 스포츠 군사주의를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역할을 자임했다. 오늘날에도 이런 풍토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인이었던 박찬호는 언론에 의해 ‘코리안 특급’으로 불리며 거대한 미국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전쟁 영웅처럼 묘사됐다. 2002년에는 ‘태극전사’들이 월드컵에서 승승장구하며 국민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고, 언론은 진보 · 보수 가릴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축구 전쟁’의 승전보를 울렸다.
| ###IMG_1### |
| 전성기 때 ‘코리안 특급’ 박찬호는 언론의 ‘영웅 만들기’ 덕택에 전국민의 성원을 한 몸에 받았다. |
한국 언론의 스포츠 보도에 나타나는 군사주의에는 뚜렷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7 · 80년대 군부독재 하에서 시민들의 사고에 뿌리 박은 군사주의 문화가 아직도 사회에 남아 있기에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언론 자체에서 별다른 자정 의지가 없다. 의 한 기자는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대결을 전제로 한 것이고, 엔터테인먼트다.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라면 크게 왜곡하지 않는 한 별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주의는 자연스럽게 애국주의, 국가주의와 결합하고 있다. 옥창준(외교 06) 씨는 “한국 언론은 스포츠를 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전쟁으로 묘사해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도록 부추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주의와 애국주의를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만 해도 한국은 선수 위의 국기를 함께 비추는 반면, 아랍의 언론은 선수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한국 언론의 애국주의적 · 국가주의적 측면을 지적했다.
| ###IMG_2### |
| 한국의 야구 영웅 이승엽도 한국 언론에게는 일본 프로야구의 ‘진품 용병’에 불과하다. |
한국 언론의 스포츠 군사주의는 외국인 선수들을 가리키는 데에 ‘봉급을 주어 고용한 병사’라는 의미의 ‘용병’이란 표현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국립 오슬로대)는 “러시아 같으면 고대 로마와 같은 고용 병사라는 의미의 ‘legionery’ 라는 용어를 쓰지만, 영어권이나 여기 스칸디나비아어권에서는 그러한 호칭을 접해본 적은 없다”며 한국 언론이 즐겨 사용하는 ‘용병’이라는 용어의 독특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용병’은 (의리 관계 아닌) 순수 고용 관계 혹은 순전히 돈 때문에 우리에게 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는 ‘한국인 선수 같으면 소속 팀과 가족적 관계를 갖게 돼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 전제로, 선수에 대한 일종의 ‘의리적 소속 관계’를 암암리에 주장하는 것이다. 선수에 대한 폭력과 무관치 않은, 인신구속적인 구시대적 관념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한국 사회도 아직 군사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실 승패를 가려야 하는 스포츠에서 전쟁의 승패와 관련된 군사주의가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 형성의 원천 중 하나인 언론에서 군사주의적인 용어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사회에서도 그런 행태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오학준(언론 06) 씨는 “이런 세태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그만큼 사회가 군사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겠냐”며 비판적 인식의 결여를 지적했다. 오 씨는 “신문의 다른 면을 보면 전술, 전략, 국지전 등 온갖 ‘전’자가 넘쳐난다. 이것이 한국 사회 전반에 군사주의 문화가 만연하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매체의 정치적 지향을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스포츠 기사들이 군사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오늘날, 한국에서 그 장막을 걷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때까지 우리의 ‘태극전사’들은 언제까지고 ‘전차 군단’과 전투를 치르고,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한 · 일전 승리를 위해 ‘투혼’을 발휘해야할지 모른다. 나날이 늘어가는 프로 스포츠계의 외국인 선수들도 언제나 ‘상품’이나 다름없는 ‘용병’으로 남을지 모른다. 스포츠는 원래 그런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