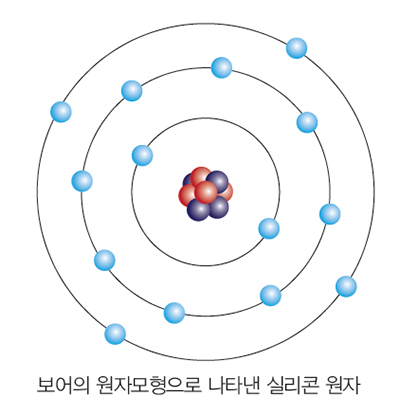방글라데시에서도 알아주는 유명 대학을 졸업한 A씨.. 어려운 가정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기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끝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알선자가 소개해준 공장에 짐을 풀고 일을 시작한 A씨. 그러나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생활이 어찌 쉬우랴. 이국땅에 홀로 내동댕이쳐진 기분이지만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일도 일이지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음식이다. 손으로 먹는 것에 익숙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며 “왜 손으로 먹느냐?” “야만인이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독실한 이슬람 신자인 A씨는 돼지고기와 개고기를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 하지만 사장님을 비롯한 동료들은 그런 A씨를 비웃으며 돼지고기 반찬을 준비해 기어코 먹이고 만다. 설사 거절하면 왜 먹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핀잔을 준다. 그래도 사람은 다 적응하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러한 생활도 이제 익숙해져 간다. 이리와? or 이리 오세요? 사장님은 A씨를 부를 때 “이리와”라고 말한다. 한국말에 서툰 A씨는 처음에는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많이 혼났다. 얼마 전 A씨는 “이리와”라는 말이 영어의 “Come here”라는 말과 똑같은 뜻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사장님과 친해지고 싶었던 A씨. 작업 도중 질문이 생겨 사장님을 불렀다. “이리와, 사장님.” 그 날 A씨는 이유도 없이 사장님에게 엄청난 욕설과 폭행을 당해야만 했다.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했지만, 다른 한국 동료들은 “원래 일을 배울 때는 다 맞고 욕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라며 울지 말라는 말만 할 뿐이다. 우린 범죄자 아니에요 photo1A 씨가 하는 일은 한국말로 지시를 받은 한국 사람들도 사고가 빈발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A씨와 같은 외국인들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고를 당하는 것 보다 사고 이후의 삶이다. A씨가 온 방글라데시와 같은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법이 형법으로 적용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보복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해 손이나 손가락이 잘린 노동자들은 그 나라에 돌아가 범죄자로 오인 받고 살아가기 십상이다.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한 후 금전적인 보상을 받더라도 고국에 돌아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의 몇 배에 달한다. 산업재해 보상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산업 재해는 한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킬 수도 있는 범죄이다. A씨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하는 등 산재 예방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도망가요 도망가!! A씨가 김포의 한 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겼을 때의 일이다. 새로운 사장님의 안내로 기숙사 방에 안내를 받아 들어가니, A씨가 모르는 여러 나라의 말로 방안 가득 어지럽게 낙서가 되어 있었다.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열심히 새 직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한달, 두 달이 지나도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장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계속 기다리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같은 기숙사 방으로 몽골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방에 써놓은 낙서를 본 그들은 “이 회사 사장은 사람들에게 일만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이다. 이 글을 보는 즉시 도망가라”는 말이라며, 그 날 밤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하지만 A씨는 업체의 사장에게 받지 못한 석 달 치의 밀린 월급도 있었고, 여권까지 맡겨 놓은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A씨는 다시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사정을 해 보았다. 그러자 “기다리라”는 말을 하던 전과 달리 “자꾸 월급을 달라고 보채면 내일 경찰서에 가서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한국으로 들어올 때 브로커들에게 지불한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로 취업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 결국 돈도 벌지 못하고 추방당하느니 새로 돈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A씨는 그 날 밤, 몰래 짐을 싸 기숙사를 나왔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 photo2A씨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안타까운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다. 네팔에서 온 한 친구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머리가 너무 아파 한국 동료에게 어떤 약을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한국 친구는 “펜잘”을 사 먹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한국말이 아직 서툰 이 친구는 약국까지 가는 동안 “펜잘, 펜잘”하며 약의 이름을 외우며 갔다. 하지만 정작 약국에 가서는 벤졸을 사고 말았고, 벤졸 한 병을 다 마신 그 친구는 병원으로 가서 위세척을 받고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경우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플라스틱공장에서 일하던 A씨의 친구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야! 불이야!”라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모든 직원들이 대피했으며, 화재도 곧 진화되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방글라데시 직원 3명이 숨진채 발견되었다. 이유는 “불이야!”라는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 미쳐 불길을 피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처럼 말 한 마디를 알아듣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A씨는 가슴이 답답하다.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과연 한국이란 곳이 내가 동경하던 앞선 나라인가, 인권국가인가. A씨가 경험한 한국이란 나라는 아직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닫힌 나라임에 틀림없다. A씨는 아직도, 자신이 젊음을 바쳐 일할 곳으로 선택한 한국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표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 이 글은 김해성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 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검색
Popular Searches
- NGO꼬레아
- 간행물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고정코너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칼럼
- 기억은 권력이다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노동법아시나요
- 대학
- 데스크칼럼
- 데스크칼럼
- 독자면접위원회
- 독자와의수다
- 독자인터뷰
- 독자코너
- 독자퀴즈
- 독자퀴즈&독자의견
- 독자편집위원회
- 독자편집위원회
- 문화
- 문화비평
- 문화비평
- 미련(美練)
- 민주화의 길을 걷다
- 민주화의길을걷다
- 발행
- 북새통
- 비하인드저널
- 사진
- 사진으로 보다
- 사회
- 서울대이슈
- 서울대저널 묻다
- 서울대저널TV
- 서울대저널묻다
- 서울대저널묻다
- 서울대저널묻다
- 세상에 눈뜨기
- 세상에눈뜨기
- 소식通
- 심포지엄
- 어느불온한시선
- 연재
- 연재기사
- 연재기사
- 오감을 유지하자
- 오감을 유지하자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우리가 만난 사람
- 우리가 만난 사람
- 이달의키워드
- 이슈앤이슈
- 이슈추적
- 저기 제가 보이시나요
- 주장
- 책소개
- 초점
- 초점
- 초점
- 칼럼·독자
- 캠퍼스라이프
- 캠퍼스라이프
- 커버스토리
- 특집
- 팀기사
- 편집실에서
- 편집실에서
- 포토
- 필름通
- 학내 노동 동향
- 학생회 동향
- 학술
- 학술기고
- 학술기고
-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