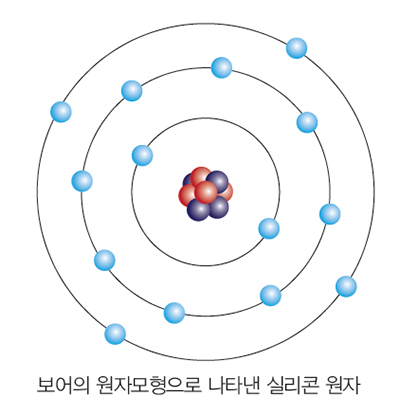다수를 위해서?
우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을 써왔고, 그 말을 일정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생활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회 정의인 것처럼 보인다. 전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제거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 분명히 우리들의 생각 속에 숨어 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어이없게도 자연권 [自然權, natural rights](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이라고 불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리주의&전체주의 19세기의 J. Bentham과 J. S. Mill에 의해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인간의 권리를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권리라는 문제에 접근할 때, 권리라는 개념을 의무와의 상관개념으로서 이해하면서도 항상 의무의 개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권리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인간의 권리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영역을 대개는 정부의 권력과의 관계 하에서 개인의 자유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자연권 이론에서와는 달리 인간의 권리를 도덕적 권리로 이해하지 않고, 실정법에 의거하는 법적 권리라고 이해하는데 기인한다. 또한 밀이 언급했던 절대적 권리인 ‘개인의 사고와 표현의 자유’ 역시 전체 공리(公利)를 위한 것이지 인간 그 자체의 권리는 아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세계가 사회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강력한 정부(혹은 지도자)를 요청하는 심리적 필요에 의해서 대두된 이데올로기이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억압적인 관료조직과 조직화된 폭력. 사고의 통제 등이 통제의 전체성을 위해서 동원된다. 그 얘로는 히틀러가 앞장 선 독일의 나치즘,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軍國主義)등이 있다. 전체주의는 그 구성체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무시되며, 인간은 전체의 유기적 구성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에 있어서, ‘도덕적 권리’라는 면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이견(異見)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리에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견해는 전체주의적 견해와 거의 같아 보인다. 한국사회는 전체주의적 사회? 지금 한국 사회는 경쟁력이라는 명제에 모두 목을 매달고 끌려가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진다.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는 최대다수의 행복을 보증하지도 못할 뿐더러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사회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면 대학도 시장논리에 맞게 구조조정 하고, 대통령도 CEO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파업하면 당연히 공권력 투입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인 것이다. 만약에 그 절대적인 목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는 이기주의자로 몰리기 쉽상이다. “물론 너희가 힘들 거 안다. 하지만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냐? 어차피 너희들도 국가가 잘 살아야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권위적인 폭력과 그에 동승한 다른 구성원들의 눈초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많은 것들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밖아 둔 것이다.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 제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재산·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정치적 조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 자주 듣게 되는 CEO적 시장, CEO적 대통령 등이 얼마나 문제있는 발상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라고 할지는 뻔한 것 아닐까?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희생되는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앞의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정액의 학비를 내고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수업권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그러한 수업권은 온데 간데 없이 대학경쟁력이라는 명제를 위해서 앞도 뒤도 안돌아 보고 뛰어가고 있다. 작년에 한참 말이 많았던 과 소속 학생들 무시한 물리교육과의 교수이동문제.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적되는 학생. 대학경쟁력을 위한 판공비는 2000년 대략 2억원에서 2001년 3억 2000만원(학교 홈페이지에 총장실 점거보고(2)에 부총장이 쓴 글에서 이렇게 주장)으로 늘리지만, 학생들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는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모습. “대학경쟁력을 위해서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중이니, 아크로에서 집회하지 말라.”고 하는 대학본부의 태도.(물론 학생들간의 갈등은 방음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학교를 다니는 우리는 경쟁력을 향해 달려가는 대학의 유기적 구성일 뿐이며, 세계수준의 경쟁력이라는 목표에 반하는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자치권력이 있어야 권리가 당연한 것이 된다. 기사를 준비에 도움을 주신 선배가 기숙사 동조교를 맡은 후배분이 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다. 그 후배 분이 얘기하길, “한 학생이 화장실에 수도가 고장났다고 얘기하러 왔어요. 고쳐달라고 하는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정말 죄송하다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 학생이 너무 위축되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수직적 관계(물론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평등권도 명확히 적혀있다.)가 익숙한 우리에가 자신보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3월 말에 학교 정문에서 있었던 불심 검문에 대해서 본 기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 것 역시 같은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관악사 자치회가 건재했다면. 총학생회가 학내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학생이 위축된 자세로 동조교에게 요구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기자가 불심검문을 만나서 학생증을 제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 셔틀버스 늘려달라고 항의할 필요도 없을테고, 이번에 총장실 점거할 필요도 없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