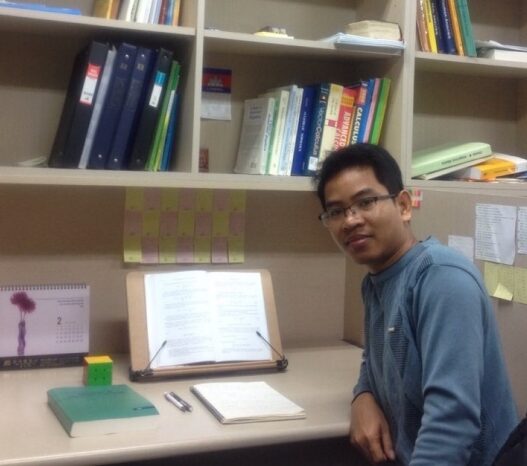이번 3월호는 발간까지 참 오랜 노력이 들었습니다. 20주년을 맞은 <서울대저널>, 한 발짝 도약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 고민했던 건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았나’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대저널>이 진정한 학내 정론지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독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널의 주독자는 곧 기자들의 선배이자 후배이며, 동기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자아탐색’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밥 먹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부터 돌아봤습니다. ‘요즘 뭐 하고 사냐’, ‘졸업하고 뭐 할 거냐’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학생들이 만드는, 학생들을 위한 <서울대저널>이 그런 이야기와 동떨어져 있진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주제특성 상 기사화가 어려운 것들도 있겠지만, 독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야기를 하자’는 데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인 동시에,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부에서 담론이 형성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커버스토리 ‘우리 졸업하고 뭐하지?’는 그런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진로고민은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내부 담론은 없고 ‘청년실업’, ‘을’ 등으로 요약되는 기성 담론만 존재한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알아야 할 이야기’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소 딱딱한 주제일지라도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집기사 ‘2015 노동시장 구조개혁, 개선일까? 개악일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올 한해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오랜 시간 고민해서 선정한 주제입니다.
저는 저널이 그렇게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학내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자치언론이니 ‘의무감에’ 살펴보는 게 아니라 매 호 매 호가 기대 속에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이 <서울대저널>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모습을 알아 갔으면, ‘우리’이야기가 담겨 재밌게 읽어 내려갈 수 있었으면, 기성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학생들은 개인화되고, 공론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생, 그리고 20대를 설명하는 표현은 대부분 외부에서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저널>이 바로 여기에 틈을 내는 성실한 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장 김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