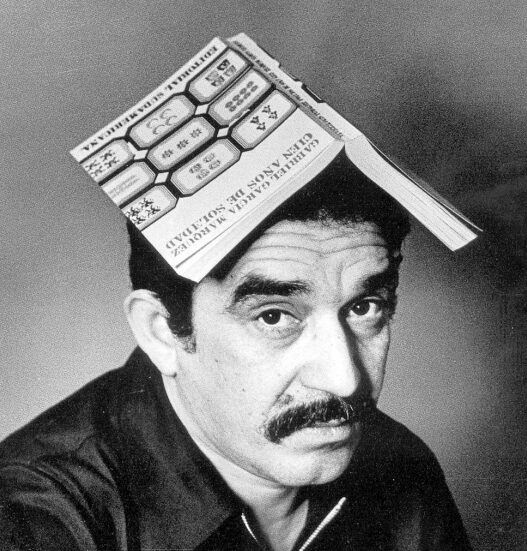서울대학교병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옛 대한의원 시계탑. 식민지배의 산물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꼿꼿하게 버티고 있다.
‘관악’은 ‘서울대학교’의 동의어로 통한다. 교지의 이름이 <관악>이고, 그 유명한 정희성의 시에서도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관악’을 접할 때마다 조금은 섭섭하다. 혜화동에 있는 연건캠퍼스에 내가 속한 탓이다. 활기찬 대학로에 둘러싸여 정반대의 칙칙함을 풍기는 이 공간에는 1500여명의 간호대, 의대, 치대 학생들이 있다. 거대한 관악캠퍼스를 대륙이라고 한다면 연건캠퍼스는 섬과 같다. 그런데 이 섬 안에는 또 다른 섬이 있다.
연건에 막 들어와 해부학 시험을 치른 1학년 의대생들은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인 오묘한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린다. 드디어 성적이 공개되는 날, 상위 10등을 제외한 140명의 학생들은 좌절감에 빠진다. 밤을 새가며 공부를 했는데도 난생 처음 겪는 두 자리, 혹은 세 자릿수의 등수. 난 과연 의대 체질이 맞나 하는 혼란. 그리고는 시작되는 의징징의 레퍼토리. 삼포세대의 청년 사회에서 의대생들의 불평은 하찮기 짝이 없지만, 이들 중에는 정말 암울한 상황에 처한 열 명 남짓한 이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독도’라고 부른다.
볼록한 정규분포의 끝자락을 넘어서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무리. 그 최하위권 성적분포 집단이 바로 독도다. 여기서 의대생들은 두 번째 섬의 존재를 자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숨어있기에 직접 볼 수는 없다. 150명의 학생들 모두가 평소와 같이 밥을 먹고, 떠들고, 도서관에 가지만 그들 중 열 명은 애써 연기를 하고 있다. 위의 140명에게 유급 제도는 일종의 자극제 역할을 하는 허상이지만, 아래의 10명에게는 실체가 있는 현실의 문제가 된다. 자칫하다간 학비 천만 원과 1년이 날아간다는 걱정. 그 보다도 더 두려운, 소외에 대한 불안함. 친구들로부터 버려진 채로 4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막막함. 온갖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독도 집단은 강의실에 앉는다. 독도는 장 그르니에가 <섬>에서 말한 비밀스러운 섬도 아니고, 정현종이 <섬>에서 가고 싶어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은 더욱 아니다.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섬일 뿐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할 것이다. 처음엔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빠진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은 개인 탓만은 아니다. 여기서도 구조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숨 돌렸을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것. 외로운 눈빛을 찾아 인사 한번 건내는 것. 용기가 난다면 ‘요새 힘든 일 있어?’ 하고 말을 걸어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작은 시도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인지도 모른다. 작은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누구라도 섬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들 자신이 섬이 된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의대생들이 세 번째로 발견하는 섬은 그들 자신이다. 의료계 뉴스를 보면서 이를 갈고, 병원노동자들의 시끄러운 농성에 짜증을 내면서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간다. 일반의 정서에서 멀어진다는 걱정은 어느 샌가 사라지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배타성을 가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주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섬의 존재는 당연시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 서로의 소외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다면 섬은 생겨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스스로 섬이 되지도, 외딴 섬을 내버려두지도 말아야 한다.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의대 한 학년 150명이 의사가 되기까지 함께 나갈 길은 멀다. 시야를 넓힌다면, 우리 밖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나갈 길은 훨씬 더 멀다.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온갖 소외로 넘쳐나는 시대다.
어디에나 섬이 있다.
그 섬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현석(의학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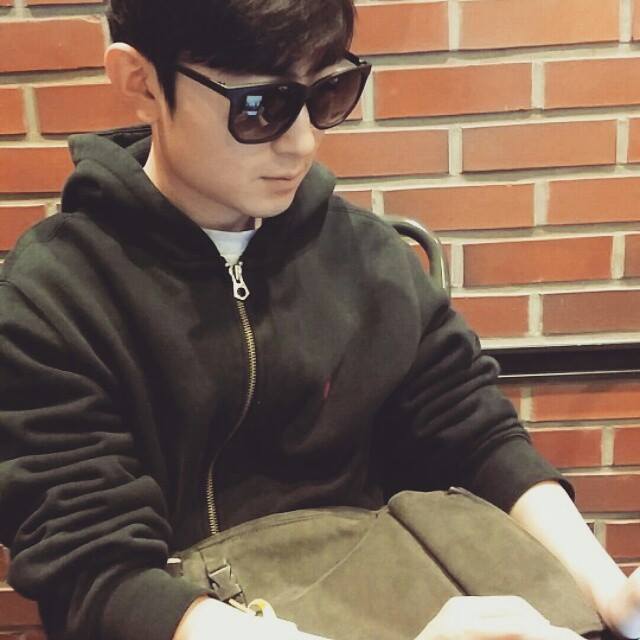
별난 의대생. 2013년 연석회의 집행부에 지원하고서부터 인생을 꼬았고, 제55대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을 맡으면서 학생사회에 뛰어들었다. 운 좋게 쓰게 된 감투에서 연대의 의미를 발견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조합원, 정치발전소 후원회원. 요즘은 별일 없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