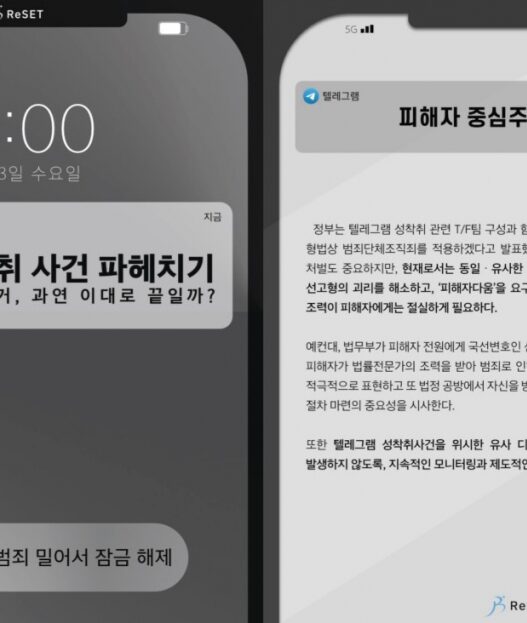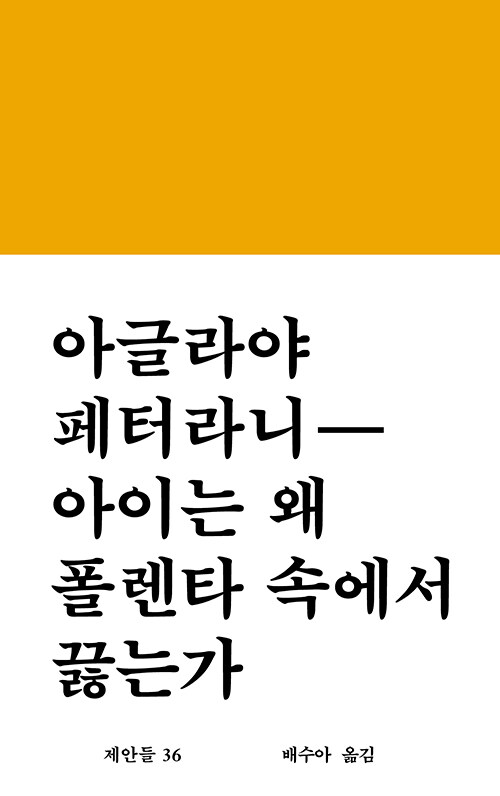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는 아글라야 페터라니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를 따라 독재 정권을 피해 루마니아를 탈출했다. 그의 가족은 서커스단의 인기 곡예사였다. 그는 가족의 공연을 따라 유럽의 여러 도시와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등을 여행했다. 평범하지 않은 작가의 유년 시절은 작품 속 ‘나’의 목소리로 말해진다.
이야기는 “나는 천국을 상상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나’는 묻는다. 신은 외국인도 이해해주는지, 그리고 천국에도 서커스가 있는지. ‘나’의 가족은 난민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생 외국인”이며, 공연장을 옮길 때마다 설치되고 해체되기를 반복하는 서커스 무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나온 이래 그들은 언제나 외국인으로 살아왔다. 동시에 그들은 광대로서 동등한 구성원이 아닌 ‘구경거리’, 사회 속의 타자가 됐다. 그들은 독재자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오히려 외국인이자 곡예사로서 이중의 소외를 경험하며 떠돌게 됐다. ‘나’와 가족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지 못한 채 삶을 영위한다.
‘나’는 수많은 나라들을 가로지르며 하나로 특정될 수 없는 경험을 얻는다. ‘나’의 삶은 국가의 경계와 정해진 구획 밖에서 만들어졌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언어가 아닌 ‘나’의 삶에서 체득한 언어를 구사한다. ‘나’는 명확한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를 가졌다. ‘나’와 그 가족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얻은 경험이 루마니아도, 스위스도, 스페인의 것도 아니듯 말이다. 언제나 남들과 다른 언어를 가졌기에 ‘나’는 이도 저도 아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글라야 페터라니는 루마니아와 스페인어를 구사했지만,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15세까지 문맹이었다. 이후 독일어 읽기와 쓰기를 독학해 글을 썼다. 자신이 택한 언어로 적어 내려간 이 글은 소설보다 시처럼 느껴진다. 문장들은 유려하게 연결되며 이야기를 매끄럽게 그려내지 않는다. 문장 간의 여백은 그가 구사하는 언어 중 하나다. 무언가에 대해 말하기 위해 힘겹게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단어들 사이로 그의 경험과 감정을 더듬어 볼 수 있는 틈이 만들어진다. ‘나’는 많은 것을 설명하기보다 생략하는 방식으로 압축적인 대사들을 던진다. 어느 나라의 언어로도 완전히 말해질 수 없는 경험은 그만의 투박하고도 고유한 언어로 풀어진다.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는 대부분 외로움, 두려움, 위태로움으로 채워져 있다. 단절된 형식의 문장들은 작가가 겪었어야 했을 현실의 취약성과 고통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다가온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어린 여자아이, 서커스, 문맹, 폭력 등의 말로 다 가늠할 수 없는 낯설고 솔직한 이야기를 마주한다. 타자로 불려왔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언어로 직접 써 내려간 유년 시절은 “작별의 폴렌타”를 먹는 상상으로 끝맺으며, 그때 소설 밖의 어딘가로 또 다시 향하고 있을 누군가의 삶에 대해 상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