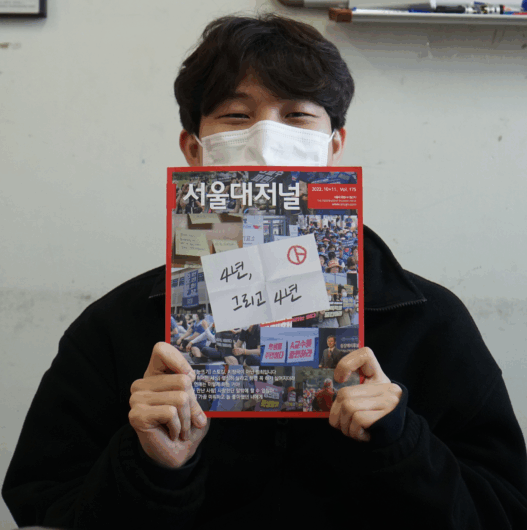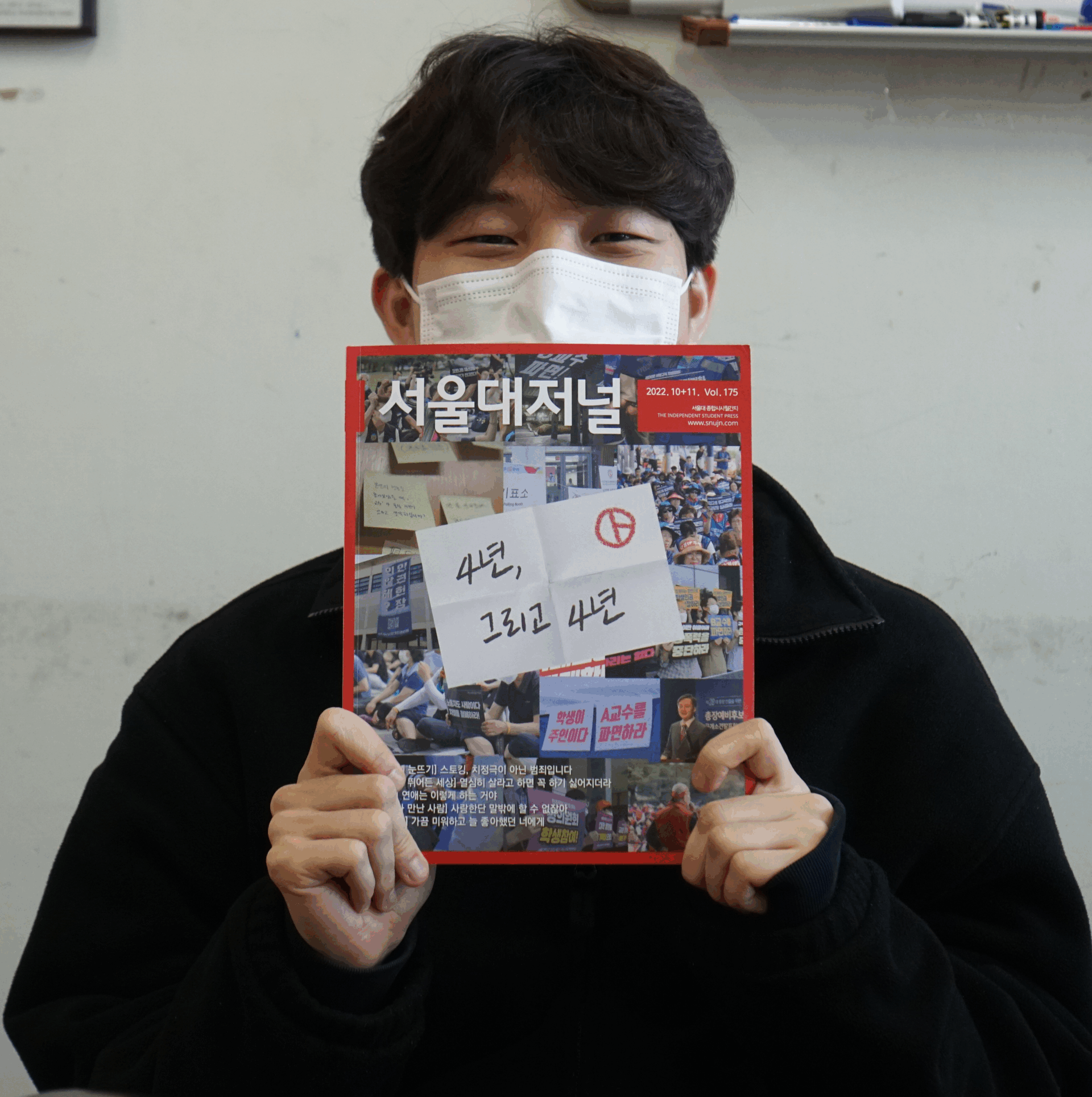<서울대저널>은 독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독자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편집위원회는 <서울대저널>이 발행될 때마다 평가모임을 가지며, 그 결과는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2022년도 2학기 독자편집위원으로는 (사진 위쪽에서부터) 김덕훈(자유전공 17), 신다솜(미학 20), 유정민(사회 21), 이은호(서어서문 졸업) 씨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75호 평가에는 독자편집위원 전원이 참여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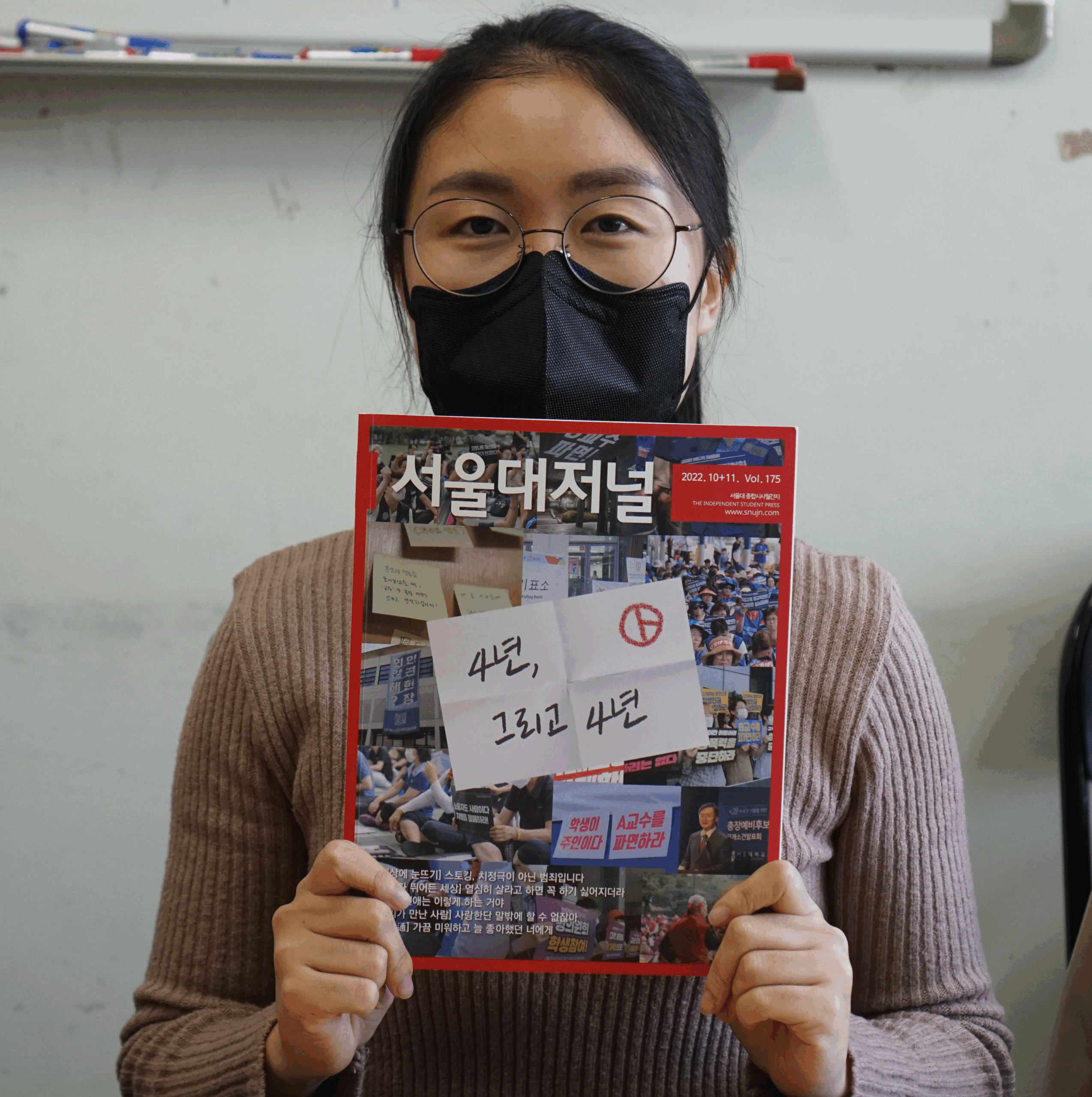

###IMG_3###
저 널175호 커버스토리 ‘4년, 그리고 4년’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김덕훈 총장선거가 있었던 중요한 때에 시의성 있게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았다. ‘인권의 사각지대, 지연된 정의를 넘어서’에서 다룬 인권헌장은 이전에도 <서울대저널>에서 관련 기사를 썼는데 기존 보도와도 잘 이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내용도 깊게 살핀 점이 눈에 띈다. ‘당신의 총장에 투표하셨나요?’도 학생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총장선거 학사 운영을 잘 짚은 것 같다. 쉽지 않은 기획을 잘 완수한 175호 커버스토리를 ‘화끈하게’ 칭찬한다.
신다솜 ‘인권의 사각지대, 지연된 정의를 넘어서’에서 교원 징계 규정의 한계점을 다루는데, 여성연구소 연구원과 인터뷰하는 등 규정의 여러 측면을 살피며 세밀하게 조사했더라. 문제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려는 노력이 보이는 대목이었다.
유정민 시간 순서에 따라 4년간의 사건을 정리한 인포그래픽이 인상 깊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였다. ‘4년 전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는 오 전 총장의 임기 동안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좋은 분석 기사였지만, 앞선 인포그래픽처럼 도식화됐으면 좋았겠단 생각이 든다.
이은호 총장 임기인 4년 동안의 학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획이라 좋았다. 4년간 서울대의 다채로운 순간들이 잘 배열된 표지도 적절했다. ‘4년 전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는 오세정 총장의 공약들을 깊이 있게 평가했다. 다만 총장추천위원회나 평의원회 말고도 교육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다른 별도 위원회들과 학생들의 관계도 같이 점검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저 널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덕훈 ‘기자가 뛰어든 세상(기뛰세)’ 코너의 ‘열심히 살라고 하면 꼭 하기 싫어지더라’와 개인 기사 ‘갓생, 자기애와 불안 사이에서’가 인상 깊었다. 두 기사가 이어지는 구성 역시 탁월했다. ‘기뛰세’ 코너는 자칫하면 기자의 개인적인 체험에 그칠 수도 있는데, 이어지는 기사에서 사회문화적인 차원으로 갓생 담론을 분석해 논의가 풍부해졌다.
신다솜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가 인상 깊었다. 연애 프로그램이 대유행인 시점에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생각해볼 지점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는 구성도 좋았다.
유정민 ‘열심히 살라고 하면 꼭 하기 싫어지더라’가 가볍게 읽으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기사였다. 기자 본인의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사진이 쓰인 것도 좋았다.
이은호 원래 체험형 기사를 좋아해서인지 ‘열심히 살라고 하면 꼭 하기 싫어지더라’가 기억에 남는다. 갓생 담론을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다고 생각한다.
저 널 175호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
김덕훈 175호는 한 권의 책처럼 느껴졌다. 갓생 이야기부터 성소수자 의료문제나 정상 연애 담론, 사실은 다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문제들이지 않나. 또 ‘온라인 서울대저널’이 이전보다 많은 호였다. 활발하고 다양하게 쓰인 온라인 보도들이 인상적이다.
신다솜 기자는 때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때로 직접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번 호의 ‘서울대저널, 묻다’와 ‘우리가 만난 사람’ 코너는 전자의 역할을, ‘필름통’과 ‘오감을 유지하자’ 코너는 후자의 역할을 해낸 것 같다. 큰 주제를 다루다 보면 독자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깊이는 줄이지 않으면서 독자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들이 보여 감동이었다. 낭만적인 기사 제목들이 유난히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정민 삶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좋았다. 왜 갓생이 유행인지, 정상 연애는 무엇인지, 차별 없는 진료실은 가능한지 등을 가늠해보며 표준으로 일반화된 삶에 의문을 가져볼 수 있었다. 한 호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가 뚜렷했던 것 같다.
이은호 학내를 중심으로 학외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대한 일종의 결산표 같았다. 커버 이외의 기사들은 전체적으로 차별과 편견, 통념에 관해 말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주제의 기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짜임새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도 있었다.
저 널 <서울대저널>이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김덕훈 <서울대저널>에서 주거 문제를 다룬 것이 꽤 오래전이다. 녹두를 비롯해 학교 근처 주거환경을 다뤄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은 없는지, 주거 관련 계약에 있어 누군가 부당한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짚어보는 기사가 나온다면 좋을 것 같다.
이은호 학교에 공사현장이 유례없이 많아 등교할 때마다 놀랄 정도다. 학교의 예산 활용과 공간 활용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다뤄봐도 좋을 것 같다.
저 널 저널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신다솜 <서울대저널>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서울대저널>의 기사들을 좋아할 것 같은 지인이 <서울대저널>을 모르고 있어 아쉬웠던 적이 있다. <서울대저널>이 이끌어내는 여러 담론에 관심 있을 잠재 독자들이 분명 많다. <서울대저널>이 더 많이 읽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