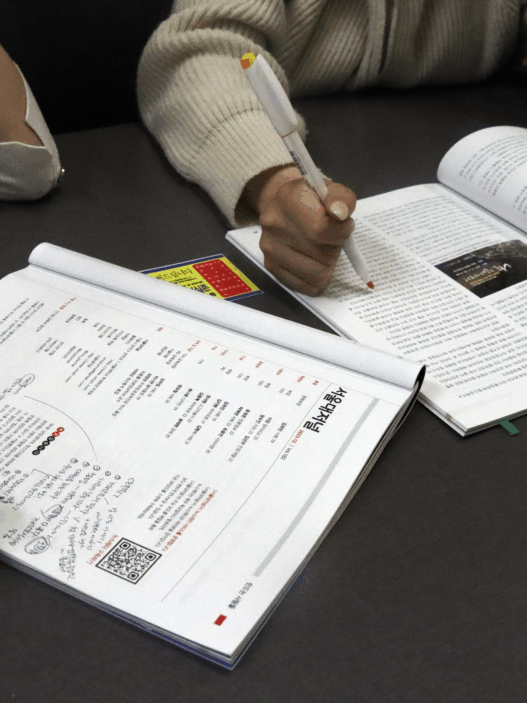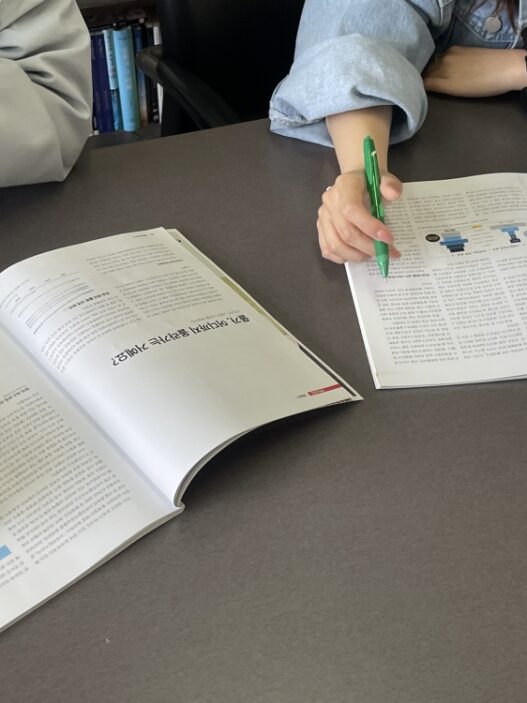<서울대저널>은 독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독자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편집위원회는 <서울대저널>이 발행될 때마다 평가모임을 가지며, 그 결과는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2023년도 2학기 독자편집위원으로는 박유진(미학 졸업), 천세민(사회복지 23), 최현수(전기·정보공학 22) 씨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을 들고있다. 사진 설명 끝.” width=”999″ height=”333″ style=”width:999px;height:333px;vertical-align:middle;” />
▲179호 독자편집위원회. 왼쪽부터 박유진, 천세민, 최현수
저 널 179호 커버스토리 ‘책책책, 책을 읽으려는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박유진 개인적으로 시의성이 있다고 느끼던 주제는 아니라 주제 선정 이유가 궁금했는데, 읽어보니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명확해서 좋았다. 하지만, 책을 읽어야 할 이유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 너무 밀도가 높았다는 느낌이 든다. 도서정가제처럼 할 이야기가 많은 주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취재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좌담회나 만남 같은 형식의 기사가 있어도 좋았을 것 같다.
천세민 친구들과 이번 커버스토리 주제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주제 자체가 요즘 떠오르는 문제의식인 것 같아 재미있게 읽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사 ‘우리는 왜 점점 책과 멀어질까?’에서 책을 읽기가 힘들고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분량을 길게 할애한 반면, 우리 세대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에 집중된 느낌이라 아쉬웠다.
최현수 세 기사 간의 유기성이 좋았다. 책을 떠올리면 책을 어디에서 읽는지, 어떻게 사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잘 해준 것 같다. 아쉬웠던 점은 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책을 파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아 덜 와닿았다는 것이다.
저 널 179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무엇인가.
박유진 사회부 개인 기사 ‘우리 동네 인권 울타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인권 조례는 기성 언론도 많이 다루지만, 제도 자체의 효용성을 지방 자치와 연결 지어 다루는 기사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 관점 자체가 차별화됐다고 느꼈다. 〈서울대저널〉이 종합 시사지임에도 상대적으로 지역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는데,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좋았다.
천세민 ‘무지갯빛 봄바람은 춘천으로부터’ 기사를 가장 재미있게 읽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 퀴어축제는 관심도가 낮다. 춘천퀴어축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운영방식이나 지역 단체들과 협업했다는 내용을 취재한 점이 좋았다. 또 와해되거나 없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179호 속에서 흐뭇하게 읽을 수 있는 기사여서 더 기억에 남았다.
최현수 ‘수해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위해’ 기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지난 호 독편위에서 저널이 개별 사실보다 더 큰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는 걸 지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저널만이 다룰 수 있는 개별 사실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사가 딱 개별 사실에 집중한 것 같아 좋았다.
저 널 179호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
박유진 주제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쉬웠다. 커버도 문화부의 느낌이 강한데, 사회부에서도 원주 아카데미극장에 대해 다뤘고, 전반적으로 문화 관련 기사가 많아 시사지라는 느낌이 덜 들었다. 또, 원론적인 설명과 전문가의 인터뷰로 이뤄진 기사가 많았는데, 취재가 현장과 조금 더 닿아 있으면 좋겠다.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다룬 기사를 읽으며 이전에 저널이 다뤘던 전주영화제와의 연결성을 느꼈다. 저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
천세민 ‘나는 나는 사랑을…’에서 이번 호의 기사들이 위태로운 것을 꿋꿋이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였다는 내용을 읽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원주 아카데미극장, 지자체의 인권 정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류가 아니라 소수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애썼다는 점에서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대학생이나 청년층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기사들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
최현수 학생회 동향, 노동 동향 코너가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고 의례적인 답변을 받는 코너처럼 느껴져 대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쉬웠다. 그리고 답변을 받지 못한 학생회가 있다면 어떤 학생회의 답변을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널 〈서울대저널〉이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박유진 학내와 학외의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을 조명하는 기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기성 언론을 따라가기보다는 대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한다. 학생회 사업에 대한 기사도 많았으면 좋겠다.
천세민 179호에서 수해 방지 대책을 다루지 않았나. 그런데 올해도 폭우가 내린 후 관정관 계단에서 마치 폭포처럼 물이 흘렀다. 179호가 발간된 이후 쏟아진 폭우에 대해서 정말 수해 방지가 잘 됐는지 후속 기사를 써 줬으면 좋겠다.
최현수 윗공대 학생인데, 동기들과 농담으로 ‘기자들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다. 누구 한 명 죽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공대에서도 기사가 날 만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널뿐만 아니라 학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 다뤄봤으면 좋겠다.
저 널 저널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박유진 최근에 신설된 코너 ‘미련’을 재밌게 읽었다. 북새통과 오감자 같은 코너들도 칼럼 같은 느낌이 짙어진 것 같아, 글쓰기 자체의 다양성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고 지루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칼럼을 쓸 때 기자들의 개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최현수 서울대 캠퍼스가 관악에만 있는 게 아니다. 동기들 중 시흥캠퍼스에 체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시흥캠퍼스 이야기도 다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