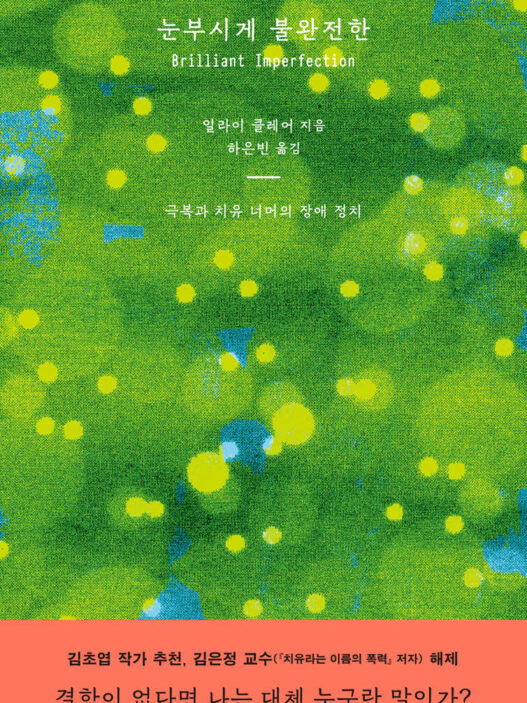연필로, 펜으로, 또 붓으로. 19명의 작가가 그려낸 현실의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전부 모호하고 불안하며, 지극히 현실적이다가도 꿈 같이 비현실적이다. 이들이 경험하고 표현한 세계는 관련 없어 보이는 대상들이 한 공간에서 부유하고,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뒤섞인 동시대의 한 장면이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9월부터 11월까지 젊은 작가들이 그려낸 비현실 예술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 『자아(自我) 아래 기억, 자아(自我) 위 꿈』을 선보인다. 심상용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은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위태롭고, 또 아슬아슬한 측면을 지속적으로 감지해 낸” 결과물로서 이번 전시를 소개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1983년부터 1996년 사이 태어난 젊은 작가 19인으로, 서로 다른 대상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의 보는 세계를 회화 작품에 담아냈다. 작가들의 시선은 동시대의 무한한 환희와 유토피아를 향해있기도, 반대로 우울하고 괴상한 지점에 집중돼 있기도 했다.
밝고 강렬한 색으로 사람과 공간을 그린 나드 채 작가의 「역」(2018)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역사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다채로운 색채의 화려함이 오묘하게 어우러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한다. 최모민 작가는 「새벽 물주기」(2018)에서 일상적인 장면에 어딘가 어색한 변주를 얹어내는 방식으로 현실과 비현실의 위태로운 경계를 표현했다. 왼쪽을 향한 몸과 정면을 응시하는 머리를 가진 아이의 눈을 낯선 이의 손이 가리고 있고, 공간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호스를 잡거나 펜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손들이 불규칙하게 배치돼 기괴한 장면들의 조합이 자아내는 혼란이 극대화된다.

지난 10월 20일에는 김영민 교수(정치외교학부)와 안소연 미술 비평가를 초청한 전시 연계 강연이 진행됐다. ‘예술이 시대를 만드는 방식’을 제목으로 한 강연에서 김 교수는 “예술이 주는 설득력은 논리적 주장이 갖는 설득력과는 그 종류가 다르다”며 “어떻게 정의하든 예술의 설득력은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처럼 작가들이 빚어낸 다양한 세계의 면면은 비록 허구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람객을 새로운 공간에 초대하고, 또 자신이 바라본 시대의 모습을 설득하고 있다.
김영민 교수는 “인간에게는 살아내기 위해 공적인 허구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우리는 양질의 허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자아(自我) 아래 기억, 자아(自我) 위 꿈』에 전시된 180여 점의 회화 작품이 그려낸 낯설고도 익숙한 세계 또한 아름다운 허구로서 보통의 일상에 특별함을 선사하고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매일의 삶에도 기묘한 모습들이 켜켜이 쌓인 허구의 지점들이 존재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