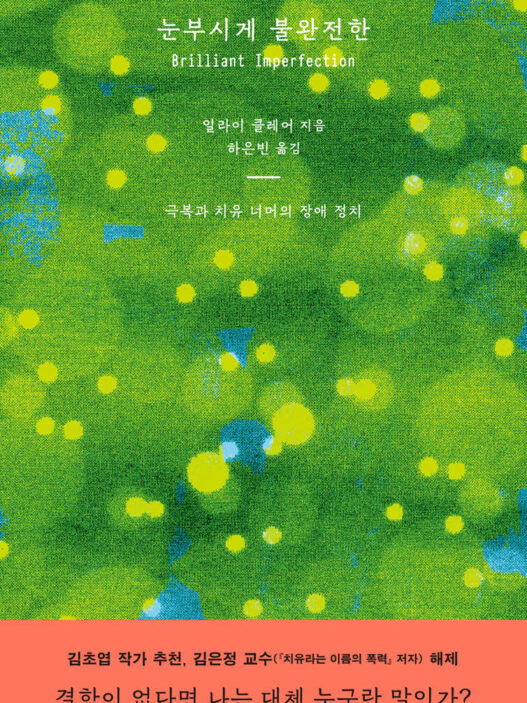출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아이를 낳는 것.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누구나 출산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 고민할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출산의 정의가 ‘아이를 낳음’이긴 하나, 배 속의 아이를 몸 밖으로 내어놓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출산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줄곧 그려왔듯 병원에서 아이가 환영받으며 태어나는 순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출산은 여성 개인에게 생애사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위험한 사건이다. 목영롱의 『굴욕 없는 출산』은 작가 개인의 출산 경험을 여성의 언어로 기록한 작업으로, 그간 가려졌던 출산의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다.
목영롱 작가에 따르면 출산은 굴욕적인 경험이다. 산부인과에서 내진을 받고, 분만 전 제모나 관장 등의 처치를 받으며, 출산 시 회음부를 절개하는 일련의 과정이 틀림없이 곤욕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때 여성들은 ‘엄마’라는 보통명사로 불리며 몰개성한 대상으로 취급된다. 출산을 위한 처치 중 고통을 호소하는 산모에게 “엄마, 가만있어요! 참아요!”라고 호통을 치거나 출산 후 “엄마, 아기에게 젖 물려야 해요.”라고 지시하는 의료진의 언설에서 여성의 인격은 철저히 손상된다. 물론 산부인과의 진료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만연하다면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데 장벽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작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진료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노출 및 훼손은 분명 수반되고, 이때의 비인격적인 처치가 실재하는 문제라는 점을 짚는다.
더욱 큰 문제는 사람들이 출산을 ‘희생적이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여성들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굴욕감, 수치심, 곤욕스러움 등이 임신 및 출산에서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결국 출산의 주체인 여성은 출산이란 경험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침묵하게 된다. 목영롱 작가는 이런 출산에 대한 통념이 “여성의 신체, 신체의 변화, 그리고 여성이 겪은 신체 체험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세한 묘사의 금기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출산에 관한 지식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 독점된 현실 또한 여성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으로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의사의 진단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의사와 환자라는 권력관계에서 임신한 여성의 몸은 사실상 병리화된다. 의료화된 출산 관행은 효율적인 처치를 위해 여성의 몸을 여성 본인의 감정과 분리해 이해하고, 그가 느끼는 고통에 무신경한 태도를 취한다. 이런 관행에 쉽사리 의문을 표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출산에 관해 말해줄 이야기를 찾지 못한다. 제왕절개 혹은 자연분만이라는 천편일률적인 병원출산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여성들은 출산 담론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출산 후에도 여성들은 배제를 경험한다. 놀랍게도 우리 사회는 출산을 마친 여성 개인에게 무신경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모든 언사의 초점은 아기에게 향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의 모습, 양육을 해낼 수 없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모습은 종종 무시된다. “거무튀튀한 선을 선명하게 간직한 채 흉측하게 꺼진 뱃가죽, 힘없이 굽어버린 허리” 등 달라진 몸을 마주하고, 산후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후유증을 경험하더라도, ‘엄마가 된’ 여성은 모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내해야만 한다. 엄마는 언제나 강하면서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집합적 표상인 모성은 여성들에게 억압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의 문제다. 헌법에 규정된 모성보호의 원칙하에 법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제도의 적용 범위가 한정돼 있을뿐더러 직장 문화는 여전히 임신한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경직된 직장 문화에서 여성은 자신을 “죄인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목영롱 작가는 여성의 임신·출산 선택을 시스템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저출산 논의는 삽질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출산이란 무엇인가. 출산을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말들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 출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출산은 사회가 여성을 ‘엄마’로 호명하기 시작하는 그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사건이다.
목영롱 작가는 “임신과 출산, 모성, 엄마라는 코드는 여성의 신체와 삶, 그리고 정체성을 때로 규정하고 더 자주 억압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모성과 같이 여성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단어의 이면에 있는 출산의 여러 장면들을 적극적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다양한 출산 경험을 언어화함으로써 출산이 여성들의 언어로 기록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편집 당한 출산의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출산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