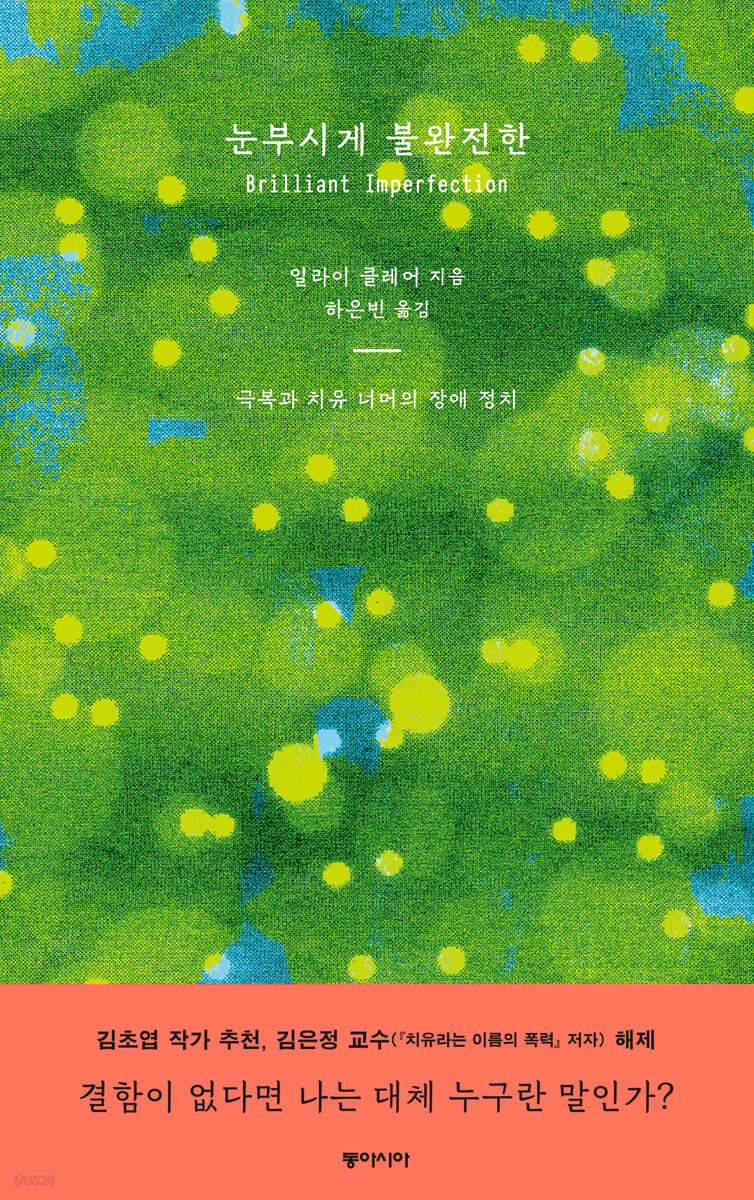
‘치유’만큼 깨끗하고 매끈한 단어가 또 있을까? 치유는 우리의 ‘몸-마음’에 깃든 아픔을 낫게 하고, 약함을 강하게 하며, 결함을 없애는 일이다. 세상엔 더 좋은 몸-마음이, 보다 나은 삶이 있고 우리는 치유를 통해 그 기준에 가 닿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치유의 깨끗함이 표백하는 것들이 있다. 정상의 몸-마음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누군가 직조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 억압이 발생한다는 것, 특히 장애는 치유가 폭력으로 휘둘러지는 자리라는 것이다. 저자는 “몸과 마음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 “인격성을 구현하는 마음이 몸보다 우월하다고 믿음으로써 비인간과 인간을 분리하는 치유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몸-마음이라 지칭한다.
일라이 클레어의 『눈부시게 불완전한』은 장애를 고쳐야 하는 결함으로 보는 시선에 기반을 두고 미세하고도 거칠게 작동하는 제도, 문화, 가치체계를 ‘치유 이데올로기’라 부르며 이를 해체하고자 한다. 장애인이자 젠더퀴어인 저자는 자기 자신의 몸-마음을 경유해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넘나들며 치유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 복잡하며 다채로운 모든 몸-마음의 존재를 위한 ‘반치유 정치’를 펼쳐나간다.
치유는 자본과 의료계가 공모한 의료산업복합체에 힘입어 강한 이데올로기로 자리하고 있다. 저자는 으레 접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한 경고를 떠올려 보라 말한다.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등의 언설에는 장애를 멀리해야 할 것, 얻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불행히도’ 얻게 된 장애는 고쳐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는 동안 자선단체도, 산업체도, 언론도, 의회도 장애를 없애고 극복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만 몰두한다. 계단을 고쳐 경사로를 만드는 등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손상을 안고 사는 삶을 한 번도 긍정해 본 적 없는 세상이, 그와 함께할 생각조차 없는 세상이 장애 당사자에게 들이미는 ‘치유’는 언제나 장애에 박멸과 사라짐만을 지시했다. 저자는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달릴 수 있는 미래”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이 엄지손가락만 돌리며 홀로 남겨지지 않을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의 반치유 정치는 언제나 깊은 늪과 같은 혼란을 마주하고 있다. 치유는 때로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해소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통증을 견디며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에게 치유 이데올로기의 억압성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힘겹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나 치유가 사회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기반”이기 때문이다. “치료나 치유 없이는 일할 수도, 학교에 갈 수도, 자립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치유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순간은 저자에게도 드물다. 저자는 절실히 치유를 원할 수밖에 없는 날들과 반치유 정치 사이의 끝없는 미로에 갇히는 일에 대해 써 내려간다. 반치유 정치는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 생에도 장애를 선택할 것인가요?’라는 못된 질문에 대답하는 일이다. 질문의 악의에 저항하는 일이 이 질문에 선뜻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지시하진 않는다. 자신 역시도 의료 기술과 치유 이데올로기 덕에 살아 있다고 고하는 저자에게 치유 이데올로기와 씨름하는 일은 상충하는 힘과 모순의 미로 속으로 스스로를 이끄는 일이다. 저자는 이런 모순 속에 놓인 몸-마음을 회피하지 않고 들여다보며,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신의 반치유 정치를 거짓 없이 이어간다. 이런 회고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막다른 길에서 나가고 싶다”고도 고백하는 저자. 그럼에도 모순 안에, 혼란 안에 그저 머물며 계속해서 사투하리라 선언하는 저자. 그의 곁에 보다 많은 이들이 가까이 모여 서는 상상을 한다.
명쾌한 탈출구가 없는 혼란 속에서 저자가 다만 헤아리는 것은 취약하고 미약한 삶이 모두의 깊은 본질이라는 것이다. 정상이 되라는 세상 앞에서 누구나 자신의 몸-마음을 구겼던 순간들이 있으리라. 저자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를 꾸렸고, 빛나는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몸-마음과 이 세계를 설명하는 많은 언어를 갖췄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여전히 버겁고 힘겨운 모서리들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리고 이 모서리들은 모두에게 조금씩은 닮은 모양으로 자리한다. 그런 미약함을 꺼내 보이고, 혼란하고 뒤죽박죽한 몸-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일을 서로 조금씩 겹쳐보기를 저자는 제안한다.
긴 글을 마치며 저자는 “언덕 너머”로 독자를 초대한다. 언덕 너머에는 “자연스러운 것과 부자연스러운 것,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모순”이 있다. 상실과 욕망, 약속과 불의, 박멸과 번성이 있다. 과거로의 회귀나 미래에의 약속은 없다. 책을 읽으며 저자가 골몰해 온 소용돌이 같은 모순에 함께했다면, 건너가야 한다. 언덕 너머로, 치유의 바깥으로. 경련하는 발걸음으로라도 경계를 넘어가며 혼란과 고민을 서로에게 속삭이자. 눈부시고 불완전한 저마다의 삶들을 엉키게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