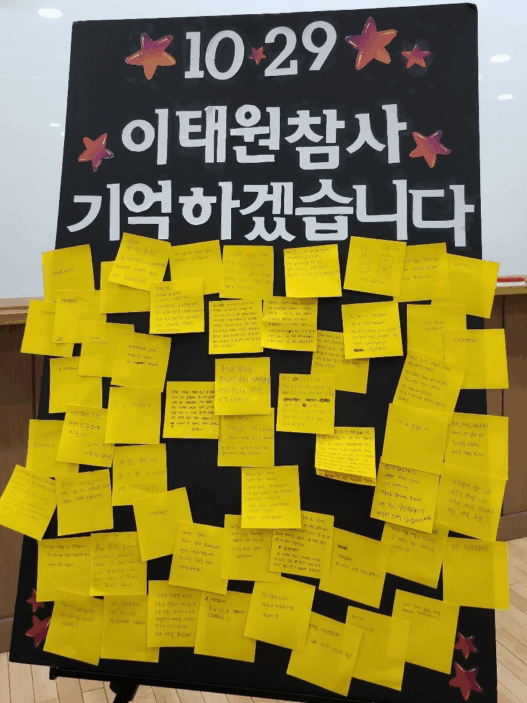새로움이 움트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3월, 또 다른 1년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기꺼이 책임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서울대저널〉 편집장. 온 마음을 쏟아온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들이 덜 애쓰고 더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앞에 오랜만에 무거운 직함을 달았습니다.
각오가 무색하게도 자꾸 무너지고 멈춰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습관처럼 뒤를 돌아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를 되뇌면서도 계속 전임 편집장과 데스크를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내게 요구한다면 부담이 될 일들을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묻고 또 묻다가도 한순간 지난날을 추억하기도 하고, 일방적인 칭찬과 응원의 말을 들으며 해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183호를 만들면서는 많이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했습니다.
책임을 마주하는 것. 누군가에게 지워진 짐을 기꺼이 나눠 드는 것. 어렵지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던 삶의 자세가 요즘 따라 더 먼 세계의 이상처럼 느껴집니다. “삶이 힘들어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았지만, 삶이 힘든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핑계를 대면 또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꾸 아쉬운 소리만 늘어놓게 됩니다. 살아가기가 벅찬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 노력하는 정부, 아니 적어도 ‘어려움을 헤아리는 척’이라도 하는 정부인데 말이죠. 그 기대가 자주 무너지는 요즘입니다.
기획회의에서 커버스토리로 높아진 물가를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옳다구나” 했습니다. 작년 교환학생을 기점으로 모든 과외를 그만둔 저를 지난 학기 내내 마음 불편하게 만들었던 건 사라진 고정 수입, 나날이 비싸지는 식비와 부담스러운 교통비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학생이, 아니 모든 시민이 같은 고민을 공유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은 지금 183호에서 꼭 다뤄야만 하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을 나눠 질 수는 없는 걸까요. 미래에 무엇을 하며 먹고 살지,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만 하는지. 실존적 고민에 매몰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다 같이 고민하고 마음 쓰며 해결책을 찾아나가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떤 무엇도 사소한 문제처럼 취급되지 않기를, 관성적으로 살기 어렵다는 한탄을 내뱉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우리의 일입니다. 당장 지금은 아닐지라도 결국 모두 우리의 일이 됩니다. 연구자 및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연구를 위해 R&D 예산 삭감에 반대를 외치는 것.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분명 관악사에도 있음을 전달하는 것. 잇따라 여성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에 주목하는 것. 누군가의 위험한 재현에 피해를 입은 이를 보호하고, 더는 유희를 이유로 소가 죽어나가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 우리의 책임을 마주하며 썼습니다. 몸도 마음도 홀로 되는 순간이 잦은 오늘날, 작은 연대를 꿈꾸며 앞에 선 이의 옷자락을 붙잡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