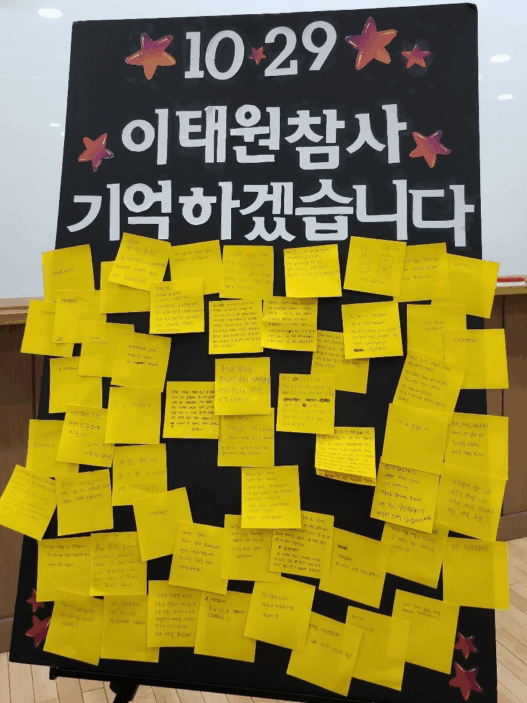구시화지문(口是禍之門). 입은 곧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의미로, 항상 언행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쓰이는 성어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요즘 들어 이 성어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언행을 조심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처럼 말하는 듯합니다.
말 한마디에 논란이 일고, 소신을 담은 발언을 하면 너무나 쉽게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어느샌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택하고는 합니다. 저 역시 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설프게 목소리를 내거나 말을 얹었다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스스로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울대저널〉에서 기사를 쓰면서, 어느새 글로써 입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은 저에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늘 입을 다물고 숨어있던 제가 직접 민감한 주제에 대해 방향성을 잡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낸다라, 반년 전의 저에게 말해주면 믿지 않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저를 바꿔놓은 걸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진행한 한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더 큰 사회에서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를 놓쳐 더는 목소리를 아예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당장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더욱 커져 닫혀있던 입을 열게 했던 것입니다.
이번 183호 기사 ‘R&D 예산을 둘러싼 5개월’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그리고 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이들은 날선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목소리가 향하는 대상이 이를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입을 여는 일, 그로 인해 닥쳐올지도 모르는 화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할 때를 놓쳐 더는 입을 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계속 누군가가 내는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입을 열지 못한다는 두려움마저 넘어선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