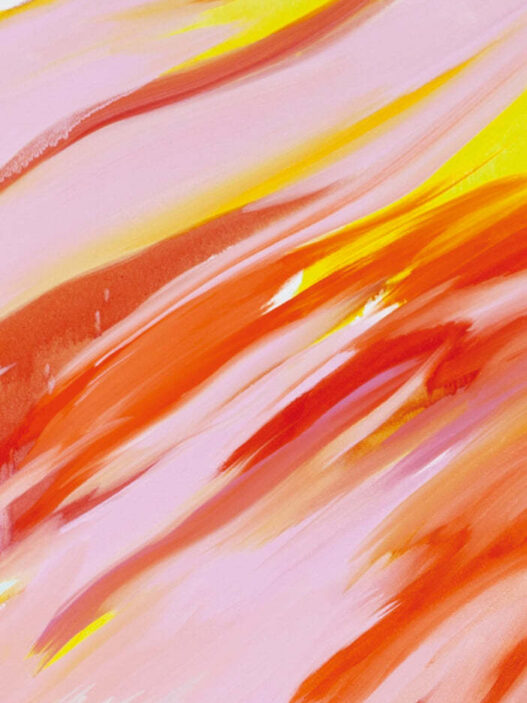“그러나 누군가는 더 검은 밤을 원한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은 W. G. 제발트의 소설 『토성의 고리』(1995)에 나오는 문장이다. 해당 소설에는 책으로만 존재하는 상상의 박물관이 등장한다. 이 문장은 바로 그 책에 적혀있다고 전해지는 글귀다. 우다영이 자신의 소설 제목으로 제발트를 빌려온 것은 사뭇 적절해 보인다. 우다영 역시 늘 상상력과 이야기로 가득한, 하나의 신비로운 박물지와도 같은 소설을 써 왔기 때문이다.
전작들과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소설집은 SF 장르로 펼쳐진다는 점이다. 수록작 중 「긴 예지」는 작년 제10회 SF 어워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중편소설인 「긴 예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들의 예지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인공지능에 학습시킨다는 상상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예지 인공지능 ‘레마’는 가장 정확한 미래의 예측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되며, 세계의 각 세력은 이 기술을 탐내 전쟁을 벌인다.
이는 모두 미래의 이야기로, 여기서 예지라는 소재를 다룬다는 사실은 무척 절묘하다. SF는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장르다. 하지만 우다영이 그려내는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다. 새로운 기술은 분쟁의 불씨가 되고, 더 나아가 전쟁의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다른 수록작에서도 인류는 기후 위기, 식량 문제, 대종말 등 되돌릴 수 없는 미래를 앞두고 있으며, 그 앞에 무력하다.
이 문제들을 단순히 미래의 파국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이미 현실에서 진행 중인 재앙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다영의 소설은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미래 시공간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가 연속된다고 상정했을 때 일어날 미래의 풍경을 그려낼 뿐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SF소설에서 ‘외삽(外揷)’이라는 기법으로 불린다. 발생할 법한 내용을 전제하고, 이의 발전을 기반으로 미래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다. 외삽은 본래 수학 용어로, 여태까지의 데이터값을 바탕으로 다음 데이터를 추론하는 계산법이다. 그러므로 SF 소설이 그려내는 미래는 현재, 나아가 과거와의 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기존의 시간을 가속한 것이 결국 미래가 된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시간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다영의 소설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지나온 시간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긴 예지」의 주인공 ‘효주’가 예지 인공지능을 완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미래로 질주하는 길이 아니라 과거로 복귀해보는 길이었다. 효주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안으로 들어가 직접 66만 번의 전생을 살아 데이터화한다. 수없이 많은 인생을 거치며 반복되는 패턴에서 미래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 끝에 효주가 맞이한 미래의 진리는 거창하지 않았다. 소설은 효주가 무한한 반복에 지쳐 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따뜻한 손길과 음식을 건네주는 장면으로 끝난다. 미래와 현재, 과거를 거쳐 온기의 순간에 돌아온 것이다. 춥고 웅크린 남의 몸을 자기 몸처럼 보듬어주는.
우다영은 작품 후기에 ‘이 소설들을 쓰며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당신과 내가 이토록 타자이며, 이토록 하나라는 사실’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처럼 우다영의 이번 소설집에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때 우다영이 그리는 자타의 일치는 단순한 공감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것은 앞서 확인했던 SF의 외삽과 이어진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연장된 산물이고, 과거를 본다는 것은 숱한 기억을 대면하는 일이다. 그리고 기억은 한 존재의 단독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과거를 바라보는 일은 그 기억에 얽힌 타인의 삶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행위이고, 이는 소설에서 수없이 많은 타인의 인생을 직접 살아보는 주인공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타인을 자신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타심의 기제를 발견한다. 우다영은 SF적 상상력을 통해, 선의의 태도를 도덕뿐 아니라 논리의 영역에서 입증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외삽은 “이 무질서한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질서정연한 선함이 나타나는 순간”을 동시에 도출한다. 외삽을 통해 암울한 미래를 그려내는 동시에, 외삽의 근거인 과거를 주유하며 미래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하는 셈이다. 우다영은 거시적인 전망에 맞서 거시적인 혁신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누군가를 돕는 한 사람의 선의를 엄밀하게 구축하고 해명한다. 그것이 어두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첫걸음이므로.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 이는 한국 근대사의 애환을 깊이 탐구한 『혼불』을 써낸 최명희의 말이다. 어떻게 어둠이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일까. 어쩌면 가장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활로는 그 어둠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 끝에서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더 검은 밤을 원한다. 외삽이 가리키는 어둠의 한계까지 밀고 간 끝에서 그 어둠을 밝힐 단 한 줌의 빛을 발견한 이 소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