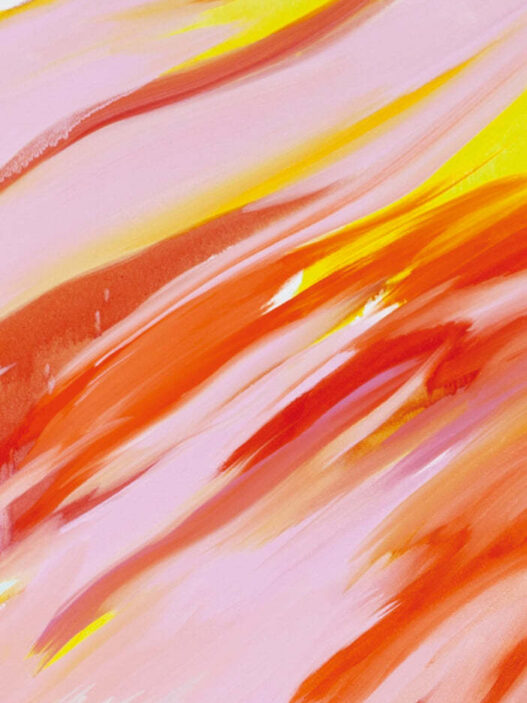에세이란 글쓴이에게 글 속 내용을 대입하는 독법이 용인되는, 허용의 글이다. 동시에 작가에게는 자신을 공개할 용기가, 독자들에게는 공개된 누군가에게 성큼 들어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용기를 내포한 글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글쓴이가 직접 발화한 글쓴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에세이는 사랑을 경험하는 글에 가깝다. 독자가 에세이 내용에 호기심을 가지고 책장을 넘기는 시간은 곧 그 글 너머의 발화자를 생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영의 산문집 『전부 취소』는, 그리하여 호영을 사랑하게 되는 글이다. 어쩌면, 그리하여 호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글일지도.

호영은 어린 시절 먹었던 할머니의 콩국수와 호박잎의 맛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시와 BL 만화, 노래 가사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발히 작업하는 번역가며, 30대에 의료적 트랜지션을 시작한 트랜스젠더다. 앞 문장 속 두서없는 정보의 나열처럼, 호영의 산문집을 이루는 글들은 긴밀히 연결돼있기보다는 각각 파편화돼있다. 이 책은 호영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책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이 책은 호영을 재단하기를 거부하는 책 혹은 호영을 호영 마음대로 편집해보는 책이므로 그 속을 채운 글들 역시 깔끔한 흐름 속에서 정리돼 있기를 거부한다. 때문에 독자들은 호영이 회사를 다닐 때의 기억과 어린 시절 할머니와 만들었던 추억, 어느 날 엄마와 나눈 대화와 퇴사 후 갖게 된 생각, 번역 작업 도중에 가수 이랑과 나눴던 대화를 이리저리 가로질러 횡단(trans-)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이 변칙적인 횡단의 시간은 호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실패한다. 호영 스스로의 입을 통해 빚어진 호영의 조각들을 살펴봤다 한들, 그 조각들을 맞춰볼 퍼즐 판이 준비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어떤 언어도, 어떤 소통도 온전한 전이(trans-)를 실패하는 이 세상에서 이해의 실패는 언제나 담보돼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목소리를 내보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리는 만큼 듣는 것이다. 호영은 산문집에서 엄마에게 자신의 호르몬 치료에 대해 고백하던 순간을 회상한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엄마에게 말했던 찰나의 순간이 아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을 회상한다. 그러면서 그는 엄마에게 못다 한 말 중 일부를 글로 남긴다.
“엄마가 바라는 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슬퍼했다. 그렇지만 내가 되지 못하고 되지 않기로 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벌하고 슬픔밖에 모르며 살고 싶지 않다. (중략) 나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나를 알아낼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나를 다시 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취소』란 산문집 역시 호영이 앞으로도 몇 번이고 반복할 다시 쓰기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말하는 연습을 할 뿐이고, 독자는 그저 그의 입에서 빚어진 찰나의 그를 생각해볼 뿐이다. 다시 쓰기의 과정은 언제까지고 반복될 것이기에 호영이 그려낸 호영은 완벽할 필요도, 불변할 필요도 없다. 어쩌면 그의 입에선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는 높거나 낮은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혹은 그 자신도 깜짝 놀랄 폭력적인 상상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욕구가 동시에 발화될 수도 있다. 그 과정 중에 발화자도 청자도 이따금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르지만, 놀라는 서로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는 시간까지도 산문집은 용인한다.
호영의 삶에서 트랜스(trans-)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그는 번역가(translator)이자 트랜스젠더(transgender)로서 끊임없이 공간을 이동 중인 여행자이기 때문이다. 번역은 출발어의 의미를 완벽하게 모방한 도착어를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다. 출발어의 의미를 듣고 모험을 나선 번역가가 한없이 낯설고도 새로운 언어를 횡단하는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출발어를 발화한 최초의 존재와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번역가가 발견한 새로운 문장이 제법 마음에 드는지 그 존재와 합의를 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일련의 과정 끝에는 늘 결과물이 뒤따랐지만, 그게 완성본은 아니라는 걸 알기에 호영은 번역이란 과정을 통해 일찍이 목적지 없이 횡단하는 삶을 깨달아왔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설명할 때, 특정 지정 성별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많은 시선 속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 존재로서만 납작하게 그려진다. 때문에, 한 성별에서 다른 성별로 넘어갈 경우 원하는 성별에 ‘도착’한 것처럼 설명된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정확해지는 방법”으로써 “더 애매해지고” 싶은 호영에게는 목적지도, 도착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몸과 불화하는 사람도 아니고, 편견을 깨부수려는 혁명가도 아니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명명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찾아 항해할 뿐이다. 그리고 설령, 항해 중 운 좋게 자신이 현재 원하는 어떤 몸에 다다른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항해를 완결짓지 않을 것이다.
호영의 글이 그리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글인 까닭은, 그의 글이 그의 몸을 닮았기 때문이다. 파편화된 그의 글들은 에세이, 소설, 시, 희곡, 일기 등의 모양새를 마구 섞고 훔치고 변용하면서 서로 횡단한다. 그들은 굳이 어떤 장르라고 지정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읽히고 싶은 외형을 찾아 여러 모양새를 조금씩 따오면서 “서로에게 파고들고, 목소리를 이식하고, 기어코 서로를 변형”시킬 뿐이다. 즐겁게, 그러나 치열하게 독자들에게 말을 건넬 뿐이다.
“내가 아무에게도 둘러대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쓴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이상, 독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전부 취소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전부 취소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전부 취소할 수 있는 자유를 당신에게 주고 싶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사랑일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