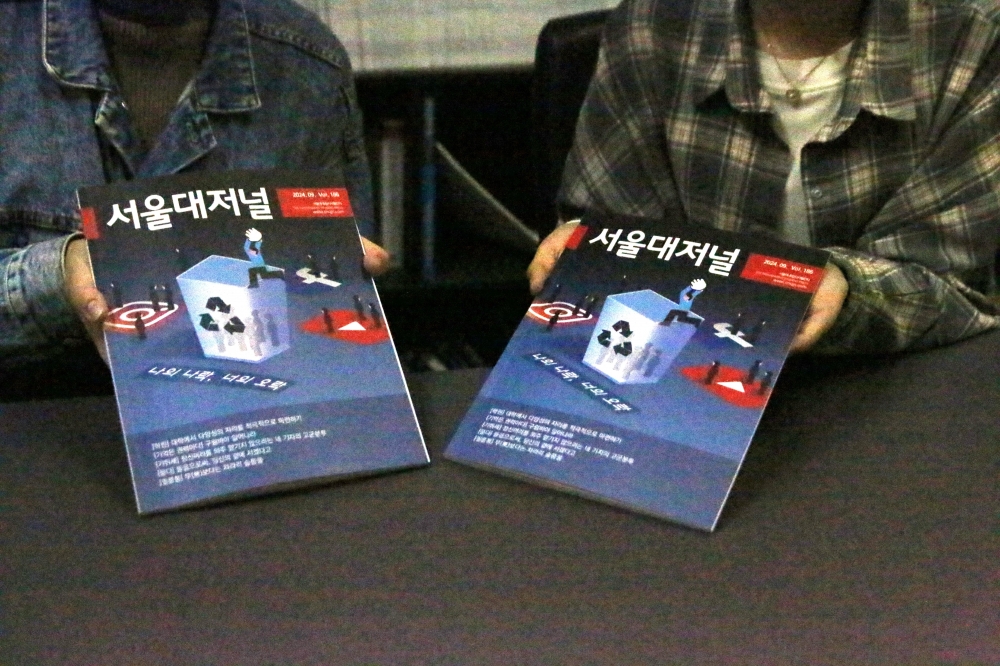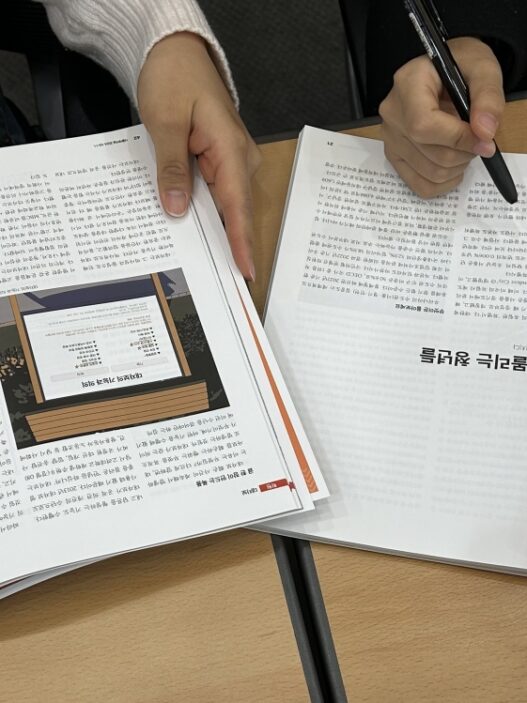〈서울대저널〉은 독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독자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편집위원회는 〈서울대저널〉이 발행될 때마다 평가모임을 가지며, 그 결과는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2024년도 2학기 독자편집위원으로는 김민주(대구가톨릭대 국어교육 20 졸), 윤성은(언론정보 22), 최하영(언어학 석사수료) 씨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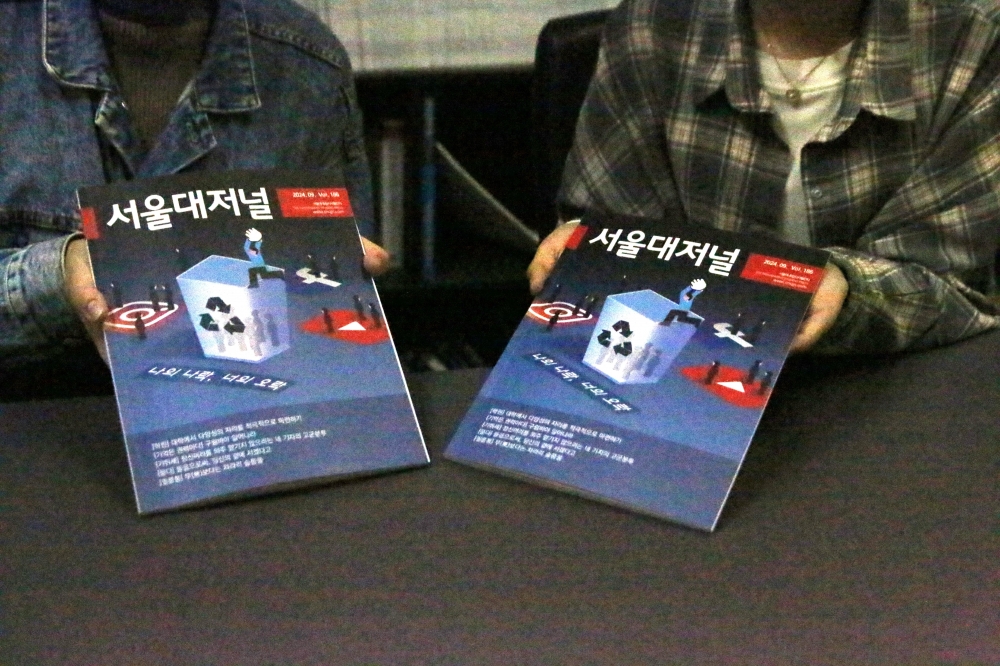
저 널 186호 커버스토리 ‘나의 나락, 너의 오락’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김민주 제목이 현시대를 잘 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미디어 콘텐츠는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사람들은 시시각각 피드백을 내놓지만, 이것이 혐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자들이 ‘나락으로의 추락’을 경계해야 한다며 시류에 등불이 돼주는 말을 해준 것 같다.
윤성은 제목이 하나같이 다 탁월했고, 핵심을 잘 짚고 있었다. 캔슬 컬처(Cancel Culture)에 대한 논문이나 기사가 많이 없었을 텐데, 자료 조사를 충실히 한 것이 느껴지는 커버스토리였다. 특히 언론 지형을 짚은 마지막 기사에서 〈서울대저널〉만의 책임감이 드러났다. 다만 담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겠지만, 인터뷰이가 주로 연구자로 구성돼 있어 전문기사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다.
최하영 개인적으로 많은 사례를 밀도 있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녹여낸 점이 놀라웠다. 적절하게 사례가 각 기사들에 동원된 것이 잘 읽혔다.
저 널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민주 ‘기자가 뛰어든 세상’의 ‘정신머리를 외주 맡기지 않으려는 네 기자의 고군분투’가 인상 깊었다. 기자들이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를 결심하게 된 것이 나의 상황과 아주 닮아 있어서, 공감이 가면서도 재밌는 기사였다.
윤성은 ‘기억은 권력이다’ 코너의 ‘구럼비야 일어나라’ 기사를 정말 재밌게 읽었다. 사실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하기도 했다.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 같다가도, 읽어보면 기자가 제주 지역에 갖고 있는 애착이 그대로 느껴지는 기사였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유구한 군사주의의 맥락, 국가폭력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결국엔 평화를 말하는 기사여서 좋았다. ‘학부대학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사는 학부대학 이슈에 꾸준히 집중한 것이 느껴져 좋았고, ‘대학에서 다양성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기사는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23」을 차분히 해석하는 동시에 학교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낸 점이 좋았다.
최하영 역시 ‘대학에서 다양성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기사가 인권헌장, 차별금지법 등의 논의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활동들을 함께 짚고 다양성 규정을 살펴본 점이 좋았다. 개인적으로 ‘사진으로 보다’의 ‘관악구 노인들의 활력소,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기사도 마음에 들었는데, 지역사회의 일부를 이루는 공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일상을 보내는 이들의 삶에 주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저 널 186호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
김민주 시의성 측면에서 탁월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커버스토리의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무게감 있게 다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수습 기사들도 인상적이었는데, 시의성이 있으면서도 명랑한 부분이 있었다.
윤성은 어지러운 세상에 너무 떳떳한 한 호였던 것 같다. 〈서울대저널〉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럼비를 잘 몰랐을 것이고, 다양성보고서도 한번 훑어만 보고 넘어갔을 것이다. ‘나락 보내는 사회’를 다룬 커버스토리도 마찬가지다. 피로감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캔슬 컬처나 나락 문화를 그저 외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떳떳하게 문제를 들여다보는 태도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놓치면 안 되는 이들에게 집중하는, 그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써낸 한 호였다.
최하영 〈서울대저널〉이 꾸준히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늘 좋다. ‘오감을 유지하자’에서 소개된 연극 「이건 이름없는 이야기야」(2024) 속 퀴어들이나 수습 기사들에서 주목한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 야구를 관람하는 여성 팬들이 떠오른다. 필름통이 다룬 《퍼펙트 데이즈》(2024)의 주인공도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며 직접 관계를 맺기는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놓칠수록 더 취약해지는 구성원들에 대해 신경 쓰는 마음이 돋보였던 호였던 것 같다.
저 널 〈서울대저널〉이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윤성은 학내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담아내면 좋겠다. ‘노동 동향’에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 기획 중인 ‘호호체육관’ 사업이 소개됐는데, 이걸 소재로 기사를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커버스토리로 국제 이슈를 다뤄보면 좋겠다. 한국 사회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시기지만, 국제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전쟁·분쟁은 물론이고, 최근 득세 중인 포퓰리즘이나 극우주의를 정치학적으로 다루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최하영 의과대학에 주목해 보면 좋겠다. 186호 ‘세상에 눈뜨기’ 코너에서 간단히 다루기도 했고 아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 바로 취재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울대저널〉의 시각에서 의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또한, 학내에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가 우후죽순 입점하는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이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다.
저 널 추가로 〈서울대저널〉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윤성은 기획연재를 시도해 보는 걸 추천한다. 당장 이번 학기는 어렵더라도 기고를 연재 형식으로 받거나, 몇 호에 걸쳐 하는 장기 취재가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하영 사진이나 영상을 다루는 TV부 콘텐츠가 더 다양해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