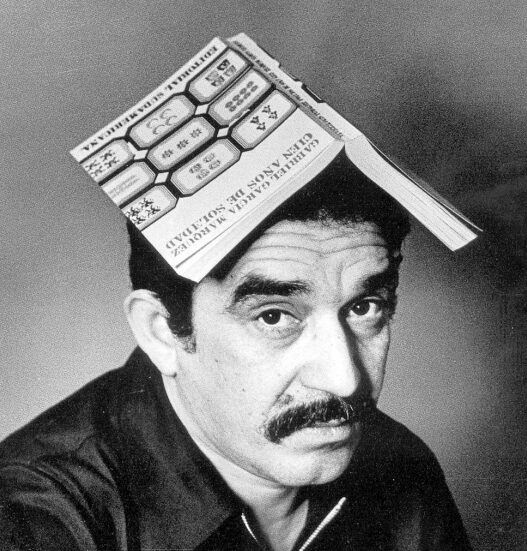학기 초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각 대학의 소식들을 접하며 이번호 특집주제를 일찌감치 ‘대학구조조정’으로 정했다. 취재를 느지막이 시작한 탓에 기사는 허겁지겁 써냈지만, 아이템 선정 직후부터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던 질문은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까”였다.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힘겨운 상황에 처한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이 자칫 제3자의 값싼 시선이 되어버릴까 고민스러웠다. 어찌됐건 아직 서울대는 학과통폐합 및 정원감축의 거센 바람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서울대생이라 해서 대학구조조정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대학과 그 구성원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담겨있다. 만약 그 요구가 잘못되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한 대부분의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 학생들은 함께 이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들로 하여금 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평가는 대학들에게 학교운영이 건전한지, 교육환경이 쾌적한지를 물어보지 않는다. 대신 얼마나 취업을 잘 시키는지, 얼마나 ‘엄정한’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는지를 물어볼 뿐이다. 한편 산업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를 요구한다. 학생들은 인문학 공부를 접어두는 대신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택하도록 요구받는다. 혹자는 학생의 취업을 생각하는 정부의 노력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왜 사회는 산업수요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돼있음을 지적하지 않는가? 그러한 질문을 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왜 취업이 안 되는 학과를 선택했냐고 묻기만 한다면, 이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더욱이 변화는 학생들이 ‘침묵을 지키길’ 기대한다. 각 대학마다 구조조정안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이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결국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방식에 반영된 사회적 요구는 대학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지 않는다. 서울대생 역시 이런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어찌됐건 서울대생들은 한국이라는 사회 속의 일원이자 대학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구조조정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다른 학교 학생들의 얘기를 전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아직 직접적인 구조조정을 겪지 않은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을 평가하고 ‘저 학교는 참 문제가 많네’라는 식으로 끝맺어 버린다면 ‘속 편한 자의 시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구조조정에 맞서는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향을 선택했다. 기자의 목소리는 줄이고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각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자 했다. 그 의도가 기사를 통해 얼마나 실현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이번 특집을 통해 서울대 바깥에 대학구조조정에 맞서는 학생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학내에서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