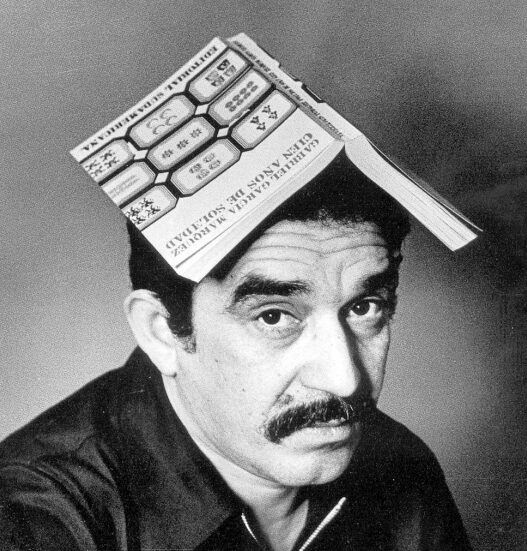“사회변화의 촉매가 되자.” 고3 여름(벌써 7년 전이다!), 쓰고 지우기를 수차례 반복한 끝에 완성한 서울대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이었다. 다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린 날 품었던 높은 이상과 당찬 포부가 담긴 이 문장만은 여전히 가슴 한 편에 새겨져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허황되고 유치한 꿈이기도 했다. 밑도 끝도 없이 세계 평화 따위를 운운했었으니까. 오죽했으면 글을 첨삭해주시던 담임선생님께서 “네 장래희망은 미국 대통령이구나?”하고 놀리실 정도였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스스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그만큼 넘치던 때였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뒤, 치기어리고 거창했던 소년의 야심은 사람들의 조언과 세상의 파도에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졌다. “네 생각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상주의를 잘라냈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꿈의 크기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지역사회로, 학교로, 가족으로……. “그래, 가족 먼저 챙겨야지. 수신제가치국…….” 그렇게 정제와 단련의 시간을 거쳐, 한때 미합중국 대통령을 꿈꾸던 소년은 성숙하고 현실적인 취업 준비생이 되었다.
현실적 한계 직시하기. 근거 없는 해피엔딩 스토리에서 벗어나기. 어른이 되어가는 당연한 과정이었다. 그런데 문득 내 자신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졌다. 에피소드 하나. 어느 날 한 후배 녀석이 밤늦게 느닷없이 찾아와 “형, 저 세계혁명을 일으킬까 하는데 함께 하시지 않을래요?” 하고 물었다. “정말 재미없는 농담이군,” 하고 피식 웃고 말았는데, 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그는 진심이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의 꿈을, 그만큼 무모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그만 비웃고 말았다.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쪽은 오히려 나였다.
시시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피터팬들
마음의 부채의식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1년 전부터 홈리스 야학에서 교사활동을 해왔다. 그래봐야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러 가면서 사회 운동에 발끝만 살짝 담그고 있는 정도다. 반면 야학을 운영하는 반(反)빈곤 시민단체 “홈리스 행동”의 상임활동가들은 그야말로 홈리스 인권 운동에 인생을 묶어버린 사람들이다. 한 달에 80만원씩 받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그들을 보다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종종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하는 섣부른 오지랖이 발동하곤 한다.
이들은 소년 시절의 나보다 더 대담하고 무모하다. 홈리스 행동은 “빈곤 없는 세상”을 꿈꾸는데 사실 그건 버락 오바마도 못해낼 일 아닌가. 활동가 본인들도 스스로 비현실적이라고 종종 자조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싸운다. 박봉에 늘 철야 근무라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마치 어른이 되기를 포기하고 평생 구연동화 속에 살길 원하는 피터팬 같다.
놀라운 건 이들의 구연동화가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임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많은 홈리스들이 기초 수급, 일자리, 주거환경, 의료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다. 나아가 이들의 투쟁은 노숙인 복지법 개정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들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다. 오직 자신의 신념과 동료들에 대한 우정, 그리고 세상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에 기대어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들을 보면서 종종 생각한다. ‘나는 너무 빨리 철들기로 결심한 것 아닐까.’ 그렇지만 결국 우유부단한 고민만 반복할 뿐이다.

아이들을 상대하려 띄운 거대한 전함이 보이는가.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도 어른들은 시답지 않은 욕망에 집착하며 바보 같은 행동들을 일삼는다. 그런데 그 어른 캐릭터들의 속내에 문득 공감이 가는 순간, 나도 꼼짝없이 어른이 되고 말았구나 싶어지면서 조금 슬퍼진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려 하십니까?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전언. “시시한 어른이 되어버린 당신들에게도 한때는 빛나는 꿈이 있었음을 잊지 마라.” 중요한 것은 꿈의 크기가 아니다. 그의 작품세계에서 어른들은 항상 부귀영화, 세계정복 따위의 원대한 야망을 이루려 한다. 반면 어린 주인공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소중한 친구들을 지키는 것뿐이다. 아이들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총칼과 군대를 부리는 어른들, 위험한 마법과 괴물을 다루는 어른들과 맨손으로 맞서 싸운다. 그런 아이들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른들의 검은 속내가 이해되고 공감이 가는 순간, 나 역시 별 수 없는 어른이 되고 마는 건가 싶어 조금 슬퍼진다.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깨끗한 등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했었다. 아침마다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 달라며 피켓시위를 하고, 방과 후에는 쓰레기 줍기와 서명 운동을 했었다. 3년이 지났을 때, 학교 앞은 몰라보게 달라져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도, 성인 나이트 포스터도 싹 사라졌다. 구청에서 인도까지 설치해줬다. 내 손으로 직접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을 때 느꼈던 그 쾌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오늘날 우리의 몸부림은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 높은 연봉과 정년 보장, 이마저도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정녕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회의감이 자꾸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무엇이 모범답안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종 다른 사람들의 꿈 목록이 궁금할 뿐이다. 당신의 어릴 적 빛나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은 무엇을 지키려 하십니까? 스스로에게도 물어본다.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전길중(인류 10)

을 들으며 영화에 대한 순애보와 세상에 대한 투쟁의식을 키워왔지만 정작 영화는 많이 안 보는 나이롱 시네필. 고전영화를 좋아하는 탓에 대중영화포비아라는 오해를 종종 받지만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알프레드 히치콕이다. 현재는 영상인류학 소모임 <애쓰는 필름>에서 잡다한 영상들을 만들며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