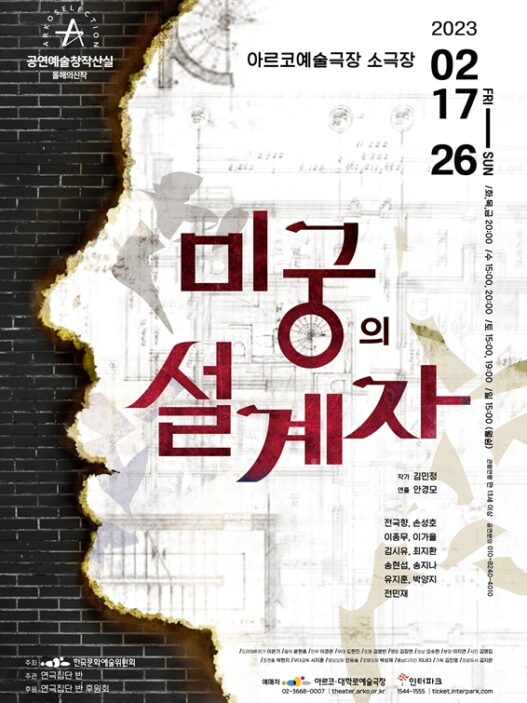사진으로 본 80·90의 서울은 혼란스러웠다. 판자촌과 건설 크레인이 공존하는, 비닐로 겨우 만들어 막아놓은 집 대문과 고급 차가 공존하는 사진들에는 그 시대만이 가진 격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선보인 올해 첫 전시는 인간과 땅이 맺는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 서울을 포착한 『뮈에인,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다. 심상용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은 전시 소개에서 “사람에게 정과 사랑의 대상이자 기쁨과 확실성의 원천이 되는 삶의 터전으로서 공간에 대한 ‘장소애(場所愛)’”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심 관장은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져간 장소애를 추억하며 “삶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특정한 양태를 공유했던 사람들은 도시 재개발의 명분 아래 소멸의 과정에 들어섰다”며 전시된 사진에 담긴 서울의 모습을 설명했다.
전시에 함께한 김정일, 임정의, 최봉림, 김재경 작가는 각자의 눈으로 본 서울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작으로 이어진 사진을 따라 전시장을 걸으며 ‘봉천동’, ‘목동’, ‘금호동’과 같은 제목들을 보고 있자면 누군가는 과거를 회상하고, 또 누군가는 겪어보지 못했던 삶의 면면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길가에 요를 펴놓고 엎드려 만화책을 읽는 소년, 무언가를 태우느라 불길이 치솟은 흙바닥을 둘러싸고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 오늘날에는 쉬이 찾아볼 수 없는 광경들이 흑백사진을 만나 전시장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최봉림 작가는 자신의 전시와 관련해 “일상의 스펙터클과 돌연히 사라지는 떠들썩함”이라는 글을 남겼다. 네 작가의 사진에 담긴 서울의 전경도 그러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진들은 달동네에 사는 이들의 삶 면면에 집중하기도, 아이들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프레임 한가득 담아내기도 했지만 전시장 끝은 결국 고요한 서울의 달동네에 닿아 있다.
임정의 작가는 ‘행당동’이라는 제목의 작품과 함께 직접 쓴 시 ‘골목길 3’을 전시했다. “사람들 정 나누며 살았던 흔적이다. 새로운 길목에서 오래된 길이 그립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모습들이 보인다.” 임 작가가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서울은 변했지만, 과거의 서울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장소애’가 담긴 사진이 40년 뒤 서울의 한 미술관을 채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