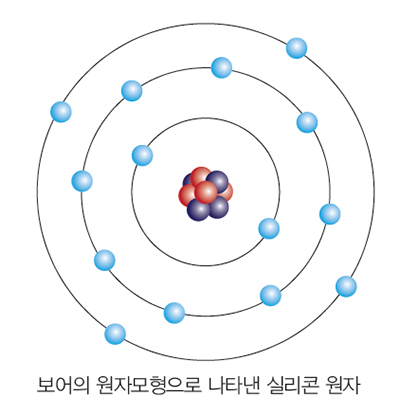다른 지면들이 이번에 갓 취재된 생생한 날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독자코너는 늘 지나가고 잊혀진 과월호 기사를 되새김질하게 만든다. 사실 사람들의 기억 저편에 매장된 기사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일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과제 제출 날짜에 내일 점심 약속, 지인들의 고민 등 기억해야 할 것들로 꽉꽉 들어찬 사람들에게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떠드는 것 같은 찜찜함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인기도 없을 것 같은 코너가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 기억의 희미함을 붙잡아 되살려내는 일이 값지기 때문일 것이다.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지는 것(한마디로 진보)은 꾸준하고 더딘 과정이다. 그러므로 진보를 일구기 위해, 또 진보로 가장한 퇴행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잠깐의 더운 열정이 아니라, 그 열정을 일으킨 배후의 자극에 대해 끈기있게 기억해내고 추적하는 것이 될 테다. 기사가 던지는 질문이 ‘지면을 빌린 혼잣말’이 아니라 공동의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나간 기사의 관 뚜껑을 여는 일이 요구된다. 96호의 ‘고시 권하는 사회’ 특집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돼서 실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뻔 했던 현상을 되돌아본다. 그동안 어느 책으로 누구의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얘기되어 왔으나 ‘왜 고시를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은 ‘뻔하잖아’라는 말로 얼버무려왔던 게 고시 담론이었다. 기사는 ‘뻔하다’는 대답 뒤에 희미해진 최초의 동기를 파고들었지만 ‘고시 이후의 삶’이 정말 그들이 처음에 바랐던 바와 일치하는지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고시 3관왕’으로 유명한 고승덕 변호사는 자서전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나서 고시는 못 봐도 고시에 붙고 나서 민주화 운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를 선택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한나라당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BBK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 후보를 무리하게 옹호하려다 ‘양념승덕’으로 빈축을 사는 신세가 됐다. 고 변호사의 경우처럼 고시를 출사할 때 품는 뜻은 일회용품처럼 잠깐 쓰다 폐기되는 구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혹 그가 고시 때문에 미뤄뒀다던 민주화의 꿈이 정치인의 부조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었다면 말이다.그런 기만을 박차고자 한다면 부지런히 기억들을 붙잡아 두자.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말자. 그 기억은 자신의 본래 신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목격도 포함한다. 물론 요새같이 중앙도서관에서 오래 공부하려면 언제 자리를 연장해야 하는지까지 기억해야 될 판국에 무언가를 기억에 덧붙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빽빽해지는 일상 속에 사람들의 기억력이 벅차지는 틈을 타 점점 뻔뻔한 일들이 판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망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기억을 기억케 하는 이 되길 바란다.
검색
Popular Searches
- NGO꼬레아
- 간행물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고정코너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칼럼
- 기억은 권력이다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노동법아시나요
- 대학
- 데스크칼럼
- 데스크칼럼
- 독자면접위원회
- 독자와의수다
- 독자인터뷰
- 독자코너
- 독자퀴즈
- 독자퀴즈&독자의견
- 독자편집위원회
- 독자편집위원회
- 문화
- 문화비평
- 문화비평
- 미련(美練)
- 민주화의 길을 걷다
- 민주화의길을걷다
- 발행
- 북새통
- 비하인드저널
- 사진
- 사진으로 보다
- 사회
- 서울대이슈
- 서울대저널 묻다
- 서울대저널TV
- 서울대저널묻다
- 서울대저널묻다
- 서울대저널묻다
- 세상에 눈뜨기
- 세상에눈뜨기
- 소식通
- 심포지엄
- 어느불온한시선
- 연재
- 연재기사
- 연재기사
- 오감을 유지하자
- 오감을 유지하자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우리가 만난 사람
- 우리가 만난 사람
- 이달의키워드
- 이슈앤이슈
- 이슈추적
- 저기 제가 보이시나요
- 주장
- 책소개
- 초점
- 초점
- 초점
- 칼럼·독자
- 캠퍼스라이프
- 캠퍼스라이프
- 커버스토리
- 특집
- 팀기사
- 편집실에서
- 편집실에서
- 포토
- 필름通
- 학내 노동 동향
- 학생회 동향
- 학술
- 학술기고
- 학술기고
-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