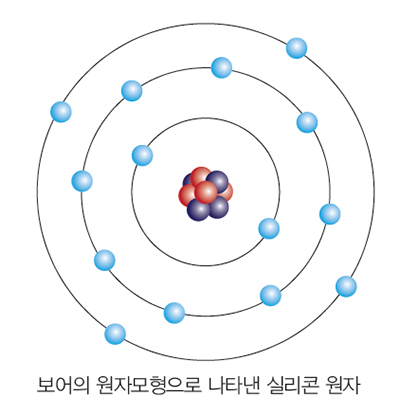매서운 추위에 코트자락과 함께 2009년의 끝자락을 여미던 지난해 겨울, 서울대저널의 바쁜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재투표함을 지나가며 총학선거사태에 대한 규탄자보들 아래 쌓여있던 서울대저널 100호를 주워들고, 스누라이프에 올라오는 서울대저널의 속보를 읽으며 지난 학기를 마무리했지요. 서울대저널의 ‘3년 독자’로서 감히 평가하자면 2009년 겨울이야말로 서울대저널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울대저널은 이번에도 역시나, 선거철에 맞추어 각 선본들에 대한 정책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발 빠르게 전해주시더군요. 특히 투표함을 개시하던 날 제기된 의혹에서부터 ‘총학사태’의 진행 상황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서울대 대표 자치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고 평가할만합니다. (짝짝짝!) 지난 호에 실린 100호 특집 기사를 보며 자치언론의 ‘쉽지 않은’ 통권 100호 발간의 기쁨을 짐작해보건대, 그 커다란 기쁨에 도취될 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서울대 학우들의 발 빠른 소식통이 되고자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12월을 맞았을 서울대저널 여러분에게 새삼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저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학생사회의 대표적 문제점은 ‘자치’의 어려움, 그리고 그 원인이며 결과인 학우들의 ‘무관심’이죠. 지난 100호는 선거와 학생회에 대해 다룬 지면을 비롯해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기획, 용산참사 이야기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뭔가 익숙하지만 그 정체는 잘 알 수 없었던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기획은 ‘생협’의 존재에 대해 일깨워 줌은 물론이거니와 법인화와 관련지어 그 가능성과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해주는 흥미로운 지면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덧붙이자면, 학내의 여러 자치 단위들과 생협의 관계라든가 자치 단위들에서 인식하는 생협의 모습을 조망했더라면 더 의미 있는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호 특집 기사들을 통해 서울대저널의 지난 행보들을 되새겨본 것도 100호 독자만이 누렸을 즐거움이었겠죠. 자치언론이 봉착한 어려움들에 대한 지적과 자기반성은 100호 발간 이후 재투표의 무산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안타까운 해소의 과정들을 떠올려 볼 때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치언론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학내 민주주의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새삼 되새길 기회를 만들어봤다면 우리의 바쁜 겨울이 더욱 뜻 깊었을 텐데요. 어느덧 새내기를 맞이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치르지 못한 선거가 다시 판을 꾸릴 테고, 용산을 비롯해, 끝나지 않은 싸움들이 계속 되겠죠. ‘학생이 만드는 학생사회, 시민이 만드는 시민사회를 위한 걸음걸음이 어쩌면 이렇게 더딘가’ 하고 생각하다가 지난 호에 소개된 ‘아크로의 전설’을 새삼 떠올려 봅니다. ‘떡진 머리’와 ‘팬더 얼굴’을 자랑스러워하며 101호를 만들었을 여러분이야말로, 맨손으로 가시를 뽑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뽑아낸 장미꽃을 들고 학우들에게 말을 건넬 ‘누군가’가 아닌지요? 100호까지 열심히 달려오며 ‘자치’를 고민하고, 학생사회의 관심을 호소해온 서울대저널. 100호 발간을 축하하기보다는 새로이 태어난 101호를 축하합니다. 자치언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봤던 지난 겨울을 분수령 삼아, 관악사회의 봄을 만들어갈 서울대저널의 새로운 발걸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래도, 그러므로, 다시 또 한 걸음
매서운 추위에 코트자락과 함께 2009년의 끝자락을 여미던 지난해 겨울, 서울대저널의 바쁜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띄었습니다.많은 학우들이 재투표함을 지나가며 총학선거사태에 대한 규탄자보들 아래 쌓여있던 서울대저널 100호를 주워들고, 스누라이프에 올라오는 서울대저널의 속보를 읽으며 지난 학기를 마무리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