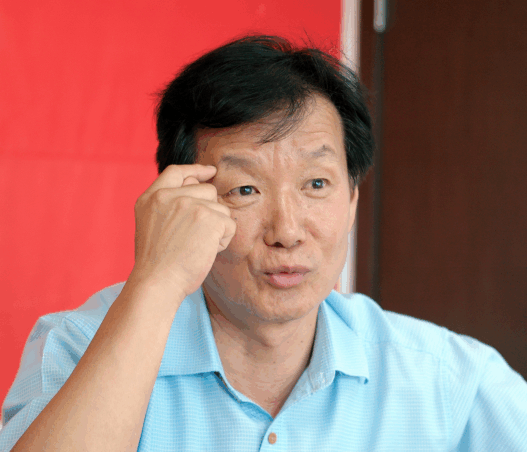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양재천 다리 위로 걸어가자 연갈색의 적십자 건물 오른편에 야트막한 건물들이 보였다. ‘철거 반대’라는 현수막들 밑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건물들은 주변의 벽화와 어울려 정겨운 느낌마저 들었다. 초록색 벽에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작은 집들, 그것이 포이동에 대한 첫 인상이었다.
| ###IMG_0### |
| 화사한 벽 너머, 포이동은 자신의 상처를 깊게 껴앉고 있었다. |
포이동의 풍경은 고요하면서 주변이 외벽의 벽화들로 꾸며져 화재의 피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골목으로 돌아가자 커다란 쓰레기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화재로 그을린 쓰레기들은 얼마동안인지 모르게 방치된 채로 있었다. 철조망과 그 근처에 매달린 주변의 노란 리본들이 도로와 포이동 사이의 경계선을 표시해줬다. 쓰레기장을 지나자 흙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갈색 흙과 흰색 컨테이너 건물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포이동이 현재 복구중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간간히 건물 사이로 주민들이 버려놓은 물품과, 타버린 제품들이 화재의 흔적을 보여줬다. 3층 회색 컨테이너 박스 2층 사무실에서 민중주거 생활권 쟁취를 위한 철거민 연합(민철연) 연대사무국장 박정재 씨를 만났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8월 23일 강남구청에서 재축조한 건물들에 대해 철거 계고장을 통보하고 떠났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화재가 난지 73일 됐지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며 “현재 밖에 놓여있는 쓰레기들도 구청에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고물상 재활용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포이동 주민들은 그나마 쓸 수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팔았다.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강남구청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쓰레기들을 방치했다. 이에 포이동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아놓고 처리해주길 요청했으나, 구청에서는 이 또한 거절하고 쓰레기장 근처에 있는 지지 리본을 떼면 치워주겠다는 조건을 반복해서 제시했다.
| ###IMG_1### |
| 화재가 난 지 70여일이 지났지만, 화재의 폐허는 그대로 포이동의 한켠에 머물러 있었다. |
포이동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배경은 이들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강제 이주로 포이동 주민들은 이 곳에 처음 정착했다. 그 후 각기 다른 곳에서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금의 포이동으로 강제이주 됐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마을을 재건해 살아왔다. 88올림픽 기간에는 도시 미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을주민들은 수감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또한 1988년에 도서관 건축으로 새 주소지가 만들어졌지만 그 주소지에 포이동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포이동은 한동안 유령마을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이동 주민들은 1990년에 토지변상금만 내면 여기서 거주권을 인정해준다는 제안에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불법 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포이동 주민들이 돈을 내는 것을 거부했다. 민철연 연대사무국장 박정재 씨는 “포이동 주민들이 민철연과 연대를 하며 권익위원회에 강제이주와 토지 변상금을 철회해달라고 2009년에 진정서를 냈다”며 “원래 이번에 결과가 발표되기로 했으나 화재가 나자 구청에서는 점유권 문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초등학생이 땅에서 주운 라이터를 이용해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이다가 큰 화재로 번진 이번 포이동 사건은 대응책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소방차를 불렀는데 30분 뒤에 한 대가 왔다. 그런데 물이 없는 상태로 와서 불을 끌 수 없다고 했다”며 박 씨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화재 초기에는 그렇게 큰 불이 아니어서 주민들도 끌 수 있을 정도의 불이었다. 그러나 소방서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해 집 한두 채의 소실로 그칠 수 있었던 불이 커져 포이동 96가구 중 75가구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박정재 씨를 따라 마을의 전체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새빨갛게 그을린 철재 벽이 그 당시 화재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포이동의 나지막한 철판 지붕들 너머에 푸른빛 유리건물의 타워팰리스가 탑처럼 서있었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두 마을의 모습은 대비적이었다. 위태로워 보이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니, 3층에 아이들의 신발이 가득 차있었다. ‘사진 촬영은 하지 말아주세요’란 요청에 카메라로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은 비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생활하고 있었다.
| ###IMG_2### |
| 주민들이 지은 그 밥에서는 그들의 따스한 마음이 묻어났다. |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며 먹고 가도록 권유했다. 현미가 약간 섞인 밥에 생선찌개, 김치, 계란 찜과 무 조림. 소박하지만 정이 묻어나는 식사였다. 배식을 하던 주민 송희수 씨께 현재 생활이 어떤지 묻자, 그녀는 “가족들이 흩어져서 지낸다”며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한 막사가 현재 남성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송 씨는 “지금 주민들은 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중이다. 화재로 인해 많이 상심했지만, 철거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로 망을 봐가며 지내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찾아온 서상빈 씨 또한 마을이 곧 철거 될 것이라는 소식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가건물에 배선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는 “공사할 곳이 많은데 뉴스에서도 철거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봉사자와 물품도 어느새 뜸해지고 있었다. 주민 송희수 씨는 “처음 한달 동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줄어들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송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받는 즐거움 보다 주는 즐거움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민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해했다. 송 씨는 특히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모아서 낸 저금통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도 고마웠다”고 말했다.
| ###IMG_3### |
| 같은 하늘 같은 지역구에서 상반된 처지의 두 마을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
포이동을 나오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저기 화재난 곳 아냐. 어떡해, 징그러워”를 속닥거리며 지나쳤다. 포이동 주민들이 입은 상처는 ‘징그러운 것’으로만 여겨지면서 포이동이 가진 아픔은 퇴색한 채, 우리 곁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