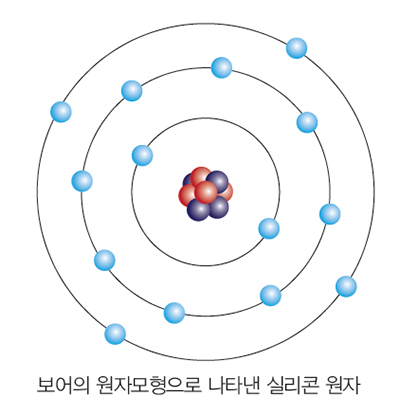퓨전음악, 국악의 영역으로 들어오다
‘사라 브라이트만, 임형주, 조수미, 양방언’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다들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그들을 강하게 묶어주는 끈은 바로 ‘퓨전음악’이다. 사라 브라이트만은 안드레아 보첼리와 ‘Time to say goodbye’를 불러 전 세계적으로 팝페라 열풍을 불러 일으켰고, 임형주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팝페라 가수로 손꼽히고 있다. 조수미는 ‘Only Love’ 앨범을 통해 클래식을 넘어 팝 음악까지 영역을 넓혔다. 양방언 역시 드럼, 베이스, 기타와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의 민속 악기들을 함께 혼합하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이질적인 여러 장르가 섞인 음악을 가리켜 ‘퓨전음악’이라 한다. 1969년 재즈에 록뮤직을 가미해서 록재즈라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의 앨범 비치스 브루(Bitches Brew)가 퓨전음악의 시작이다. 이러한 퓨전음악의 흐름은 재즈와 록, 클래식과 팝 뿐만 아니라 국악과 클래식, 국악과 팝음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캐논 변주곡이 등장하고, TV 광고에서는 비트박스가 어우러진 가야금 연주에 B-boy들이 춤을 춘다. 대중가요 같은 친근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가야금과 해금연주는 아무리 들어도 어떤 음악인지 기억나지 않는 전통 국악과 다르게, 몇 번 듣지 않고도 흥얼거릴 수 있을 만큼 귀에 쏙쏙 들어온다. photo1photo2국악은 움직이는 거야!photo3이처럼 국악이 변하고 있다. 아니 국악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일이다. 1960년대 이후 황병기, 이성천, 박범훈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창작국악은 바로 이런 흐름을 대변한다. 창작국악이 전통국악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작곡가와 연주자가 분리되면서 음악에서 작곡가의 창조성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창작가야금 음악의 창시자이자 독보적 존재인 황병기는 가야금 연주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최초의 가야금 독주곡인 ‘숲’을 작곡, 연주했고 ‘침향무’, ‘미궁’ 등의 연주곡을 탄생시켰다. 그의 작품에선 민속음악의 전통을 현대화하거나 가야금에 서양악기 하프의 기법을 도입하는 등 갖가지 시도도 이뤄졌다. 다시 말해 서구적인 것이 전통음악에 많이 가미된 것이다. 하지만 국악의 변화는 창작국악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1985년 슬기둥이라는 국악 그룹의 탄생으로 창작국악과는 달리 대중성을 지향하는 퓨전국악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언뜻 보기에 창작국악과 퓨전국악은 전통국악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국악평론가 이소영 씨는 서양음악의 클래식(classic)과 팝(pop)을 예로 들며 창작국악과 퓨전국악의 차이를 설명한다. “창작국악은 클래식처럼 작품이 중심이예요. 작곡가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죠. 반면 퓨전국악은 팝처럼 대중음악적인 감수성을 지향하죠. 즉흥적이며 뮤지션이 중심이 되어 엄격성을 벗어난 음악을 만들어 내기도 해요. 퓨전국악 앨범을 들어보면 기타나 신디사이저가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음악시장 중에서도 대중음악 시장을 겨냥해 퍼포먼스를 중요시하고, 작곡가 중심에서 연주가 중심으로 중심축이 기울게 된 국악을 퓨전국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퓨전국악의 새로운 임무, 대중을 공략하라이처럼 대중성을 지향하는 퓨전국악의 선전은 눈에 띌만큼 명확하다. 퓨전국악 앨범과 연주가 양적으로 늘어난데다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까지 국악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성공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악 평론가 윤중강 씨는 “개인의 창작성을 넘어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퓨전국악이 발전하면서 국악이 요즘 세대들까지 향유할 수 있는 젊은 국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퓨전국악을 국악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라 이야기 한다. 윤 씨는 저서 에서도 서구에 유입된 장르를 한국악기로 옮기는 일이 맹목적인 서구문화 추종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토 확장의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언급한다. 전통악기와 전통적인 어법이 국악의 주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은 아니기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용성을 갖고 있는 퓨전국악은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들어내는 전진기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퓨전국악은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것이라 그런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훨씬 친근한 느낌이다. 대체 어떤 점이 대중의 마음을 Rm는 것일까? 우연히 라디오 국악방송을 통해 퓨전국악을 접하게 됐다는 권가람(서문 05) 씨는 “퓨전국악이 다른 어떤 장르보다 퓨전의 범위가 넓고 과감하잖아요. 심지어 록음악도 국악과 어우러지고 있어요”라며 퓨전국악의 넓은 범위를 매력으로 꼽았다. 또 “무엇보다 정악보다 쉬워서 전통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며 퓨전국악이 전통국악과 단절된 대중들 사이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악의 문외한이 듣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전통국악과 달리 퓨전국악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Easy Listening)’을 지향하는 셈이다. ‘퓨전’국악이 아니라 퓨전‘국악’photo4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퓨전국악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업화와 대중화가 국악의 본질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평론가 이소영 씨는 퓨전국악이 양적 성장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퓨전국악이라 내세우는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 퓨전국악이 대체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모호하지만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양적인 성장은 불가피한 것 같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일제시대 신민요도 그러했듯 양적, 질적 성장은 어느 정도 함께 갈 수밖에 없으며 양적인 성장, 즉 퓨전국악이 만개한 상황에서 질적으로도 좋은 곡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란 의미다. 다만 아직은 퓨전국악이 초창기다보니 양적으로만 폭발적으로 성장했지 질적으로는 세분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photo5한국의 놋쇠그릇에 피자를 담아내고서 퓨전음식이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명확한 의미의 ‘퓨전’이 되려면 김치 피자처럼 피자 속에 김치라는 알맹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피자라는 서양음식에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한다. 이씨는 국악도 마찬가지라며 “이지 리스닝에 치우쳐 하프소리와 구별되지 않는 가야금 소리, 바이올린과 다를 바 없는 해금소리가 되버린다면 이는 퓨전국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퓨전국악은 현재 대중들의 인기를 끌면서, 메말랐던 국악음반시장의 단비와 같은 존재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과열현상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퓨전’에 찍혀있는 방점을 ‘국악’으로 옮겨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양한 음악 장르 중에서 재즈가 하나의 고급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퓨전재즈에서 ‘재즈’의 방점을 놓치지 않았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