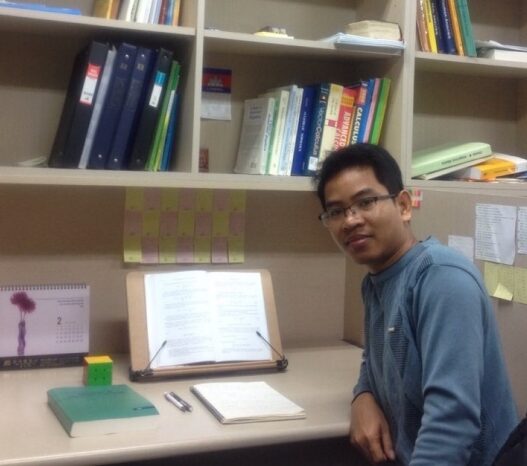9월이다. 2학기의 시작이며 계절상 가을을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다들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서 색다른 마음가짐과 알찬 계획들로 새 시간표를 짜고 있을 것이란 예상,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가끔은 이렇게 새로운 학기, 새 계절, 새 분기를 맞이할 때마다 갖게 되는 마음가짐 때문에 일부러라도 자주 분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스스로에게는 관대해지기 쉬운 인간이기에 무언가 자꾸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경우 지금보다 나은 자신이 되고자 더 분발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그리 틀린 것 같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별다른 변화나 개선의 여지도 없는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반복은 사람을 더욱 지치게 하고, 극으로 몰고 가고는 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밭에서 잡초를 솎아내는 기분으로 한 땀씩 한 땀씩 내 단점을 골라내버리는 재미를 느끼면서 자신을 돌보는 일은 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무한 작심삼일이라면 성자(聖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지난 학기말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던 1학기 평은 대부분 ‘한 일은 없이 시간만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였다. 혹자는 내 주변의 지인들이 유난히 시간과의 경주에 뒤쳐지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들 자신 있게 지난 시간을 알차게 사용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래저래 바쁜 것 같기도 하고 느슨한 것 같기도 한 방학을 보내고 있던 8월의 끝 무렵 우연히 들춰보았던 책이 하나 있었다. 제목도 종류도 생각나지 않지만 거기 적혀있던 한 글귀가 주던 강한 인상 덕에 제목의 자리까지 오른 능력 좋은 글귀이다. ‘그 사람은 그가 보낸 시간의 아들이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자꾸 재촉하는 개인 코치가 생긴 것 같고, 서울대저널에 있어서는 70호, 80호에 이은 100호라는 멋들어진 자식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태교지침이 생긴 것 같다.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짐해보는 것과 동시에 빠뜨릴 수 없는 말은, 현 기자들과의 자축성 멘트이면서 지켜봐주시는 선배들과 독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기도 한 ‘서울대저널 60호 축하합니다’인 것 같다.
검색
Popular Searches
- NGO꼬레아
- 간행물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고정코너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칼럼
- 기억은 권력이다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노동법아시나요
- 대학
- 데스크칼럼
- 데스크칼럼
- 독자면접위원회
- 독자와의수다
- 독자인터뷰
- 독자코너
- 독자퀴즈
- 독자퀴즈&독자의견
- 독자편집위원회
- 독자편집위원회
- 문화
- 문화비평
- 문화비평
- 미련(美練)
- 민주화의 길을 걷다
- 민주화의길을걷다
- 발행
- 북새통
- 비하인드저널
- 사진
- 사진으로 보다
- 사회
- 서울대이슈
- 서울대저널 묻다
- 서울대저널TV
- 서울대저널묻다
- 서울대저널묻다
- 서울대저널묻다
- 세상에 눈뜨기
- 세상에눈뜨기
- 소식通
- 심포지엄
- 어느불온한시선
- 연재
- 연재기사
- 연재기사
- 오감을 유지하자
- 오감을 유지하자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우리가 만난 사람
- 우리가 만난 사람
- 이달의키워드
- 이슈앤이슈
- 이슈추적
- 저기 제가 보이시나요
- 주장
- 책소개
- 초점
- 초점
- 초점
- 칼럼·독자
- 캠퍼스라이프
- 캠퍼스라이프
- 커버스토리
- 특집
- 팀기사
- 편집실에서
- 편집실에서
- 포토
- 필름通
- 학내 노동 동향
- 학생회 동향
- 학술
- 학술기고
- 학술기고
-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