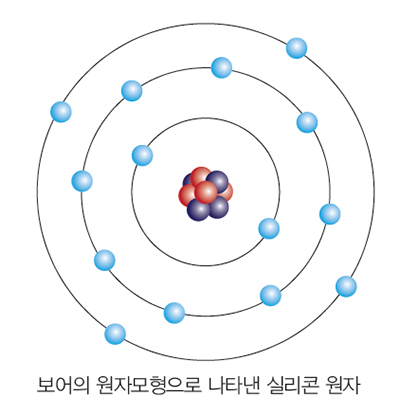정치교수, 어용교수, 폴리페서….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말이다. 다양한 용어만큼이나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각기 다른 평가를 받았다. 반정부적인 교수들은 정치교수로, 권력을 지향하던 교수들은 어용교수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부 요직으로 대거 등용되기 시작한 교수들은 폴리페서로 불렸다. 그리고 지난 18대 총선과 10․26 서울 시장 선거 당시에는 폴리페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신(新)폴리페서’라는 프레임까지 등장했다.일부 언론에서도 ‘폴리페서’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다. 는 SNS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일부 진보 성향의 교수들을 일컬어 ‘신폴리페서’라 규정했다. 이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한 것처럼 “기존의 정치권을 독점하려는 폭력적인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신폴리페서’로 규정되는 교수들에 대해 “교수는 연구에나 신중하라”고 비판하면서도, 한나라당 의원 중 현직 교수가 21명이나 되고, 서울대 김난도 교수(소비자학과)를 영입하려 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는 사뭇 달랐다.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82.4%는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할 권리가 있다’고 응답해, 교수의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수들 또한 마찬가지다. 조국 교수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지지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세일 교수 역시 “학자는 소신과 철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이를 정치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문과 정치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역설했다. 지식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의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폴리페서’를 둘러싼 논란은 첨예하게 지속되며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교수들을 기용하려 하고, 몇몇 교수들 또한 정치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 이제까지의 논란을 돌아보며 폴리페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봤다.
검색
Popular Searches
- NGO꼬레아
- 간행물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거리인터뷰
- 고정코너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칼럼
- 기억은 권력이다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가뛰어든세상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기자수첩
- 노동법아시나요
- 대학
- 데스크칼럼
- 데스크칼럼
- 독자면접위원회
- 독자와의수다
- 독자인터뷰
- 독자코너
- 독자퀴즈
- 독자퀴즈&독자의견
- 독자편집위원회
- 독자편집위원회
- 문화
- 문화비평
- 문화비평
- 미련(美練)
- 민주화의 길을 걷다
- 민주화의길을걷다
- 발행
- 북새통
- 비하인드저널
- 사진
- 사진으로 보다
- 사회
- 서울대이슈
- 서울대저널 묻다
- 서울대저널TV
- 서울대저널묻다
- 서울대저널묻다
- 서울대저널묻다
- 세상에 눈뜨기
- 세상에눈뜨기
- 소식通
- 심포지엄
- 어느불온한시선
- 연재
- 연재기사
- 연재기사
- 오감을 유지하자
- 오감을 유지하자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온라인서울대저널
- 우리가 만난 사람
- 우리가 만난 사람
- 이달의키워드
- 이슈앤이슈
- 이슈추적
- 저기 제가 보이시나요
- 주장
- 책소개
- 초점
- 초점
- 초점
- 칼럼·독자
- 캠퍼스라이프
- 캠퍼스라이프
- 커버스토리
- 특집
- 팀기사
- 편집실에서
- 편집실에서
- 포토
- 필름通
- 학내 노동 동향
- 학생회 동향
- 학술
- 학술기고
- 학술기고
- 학원